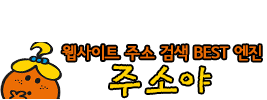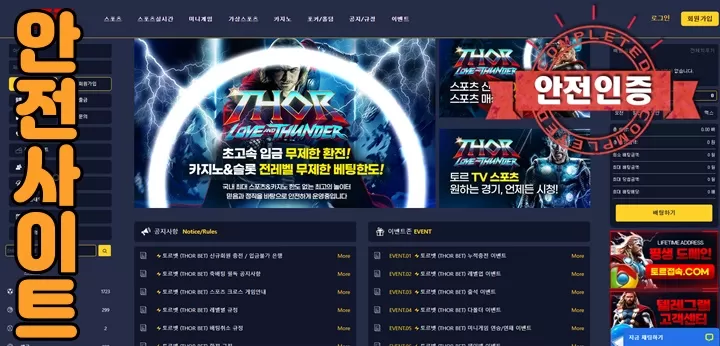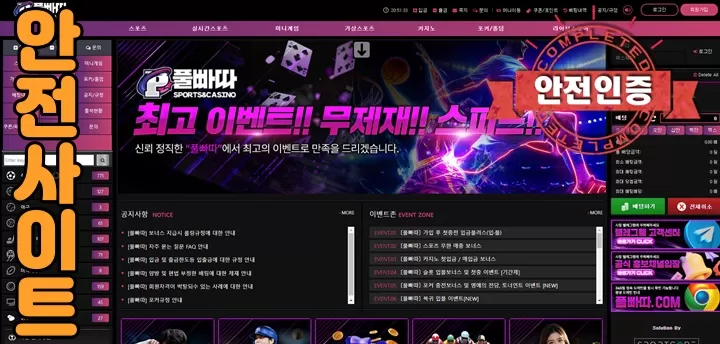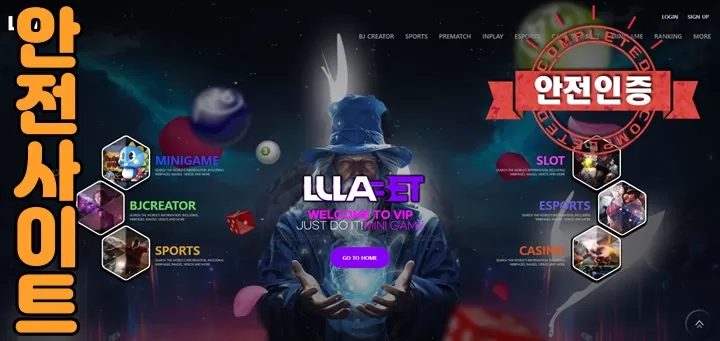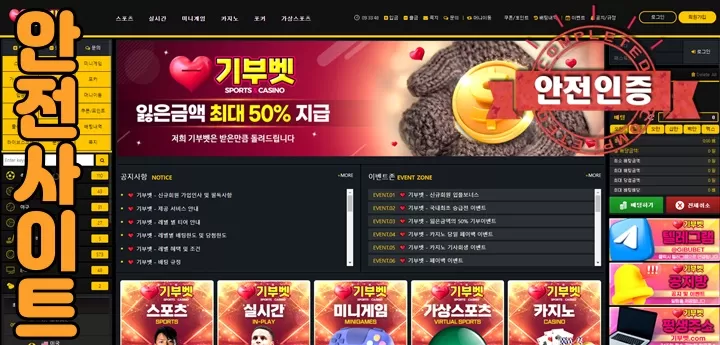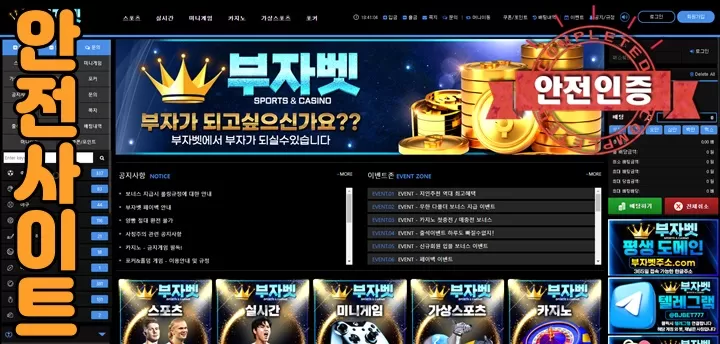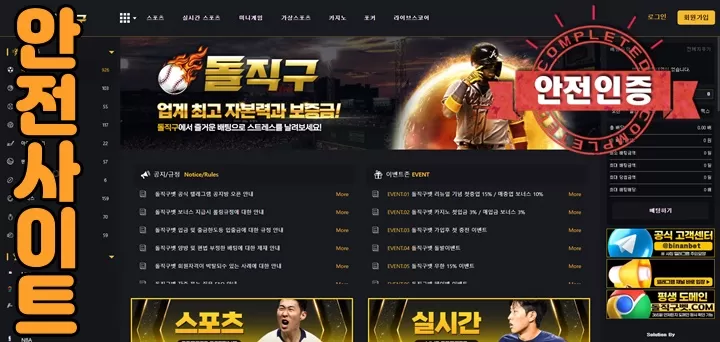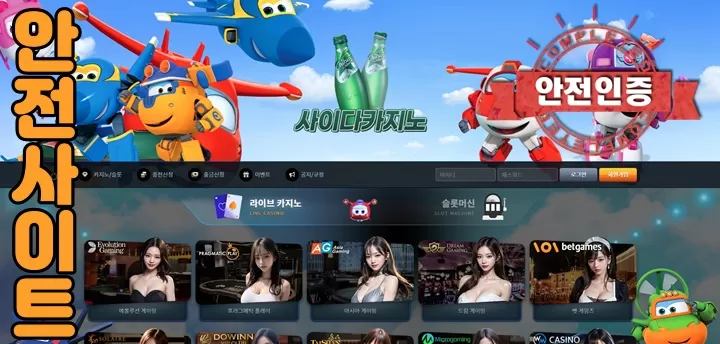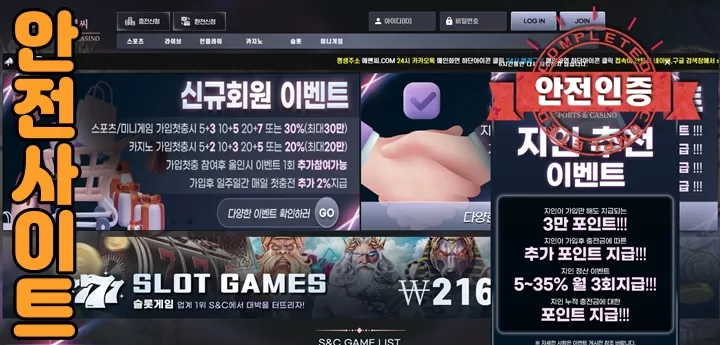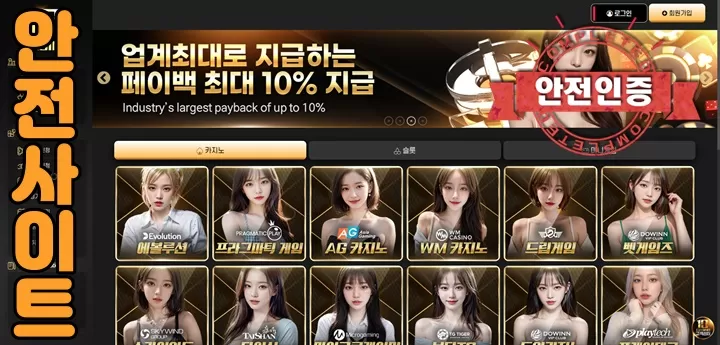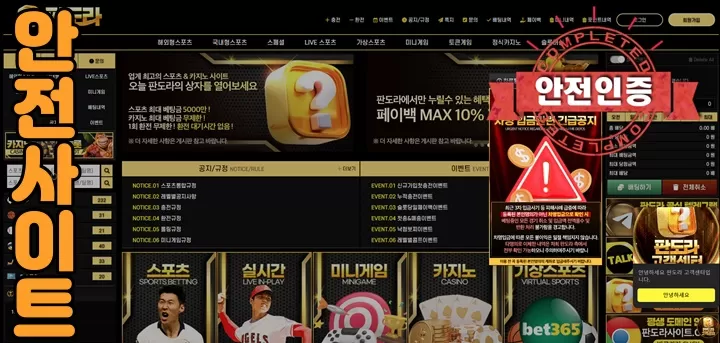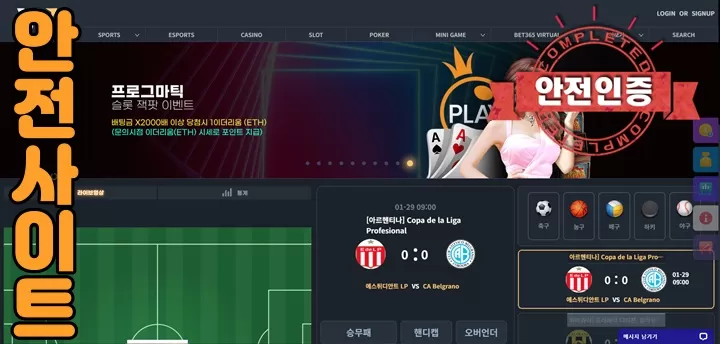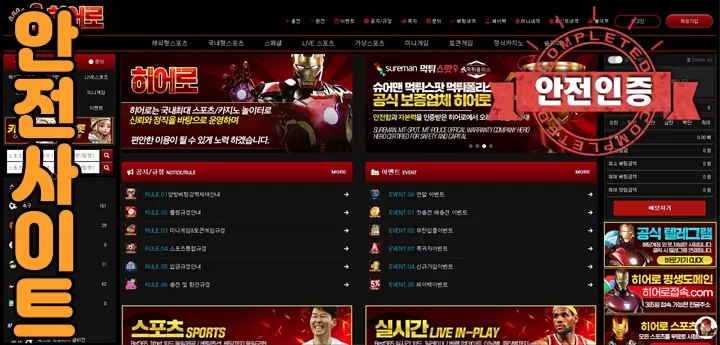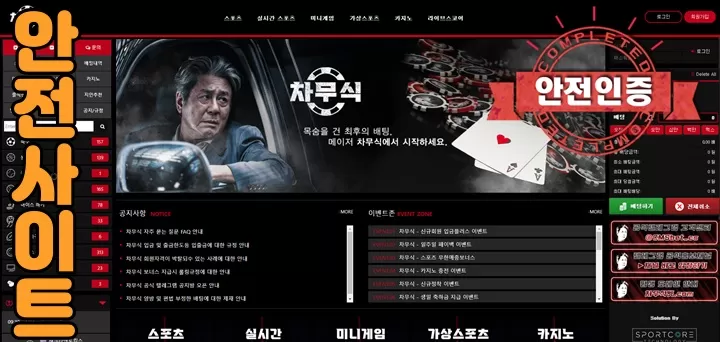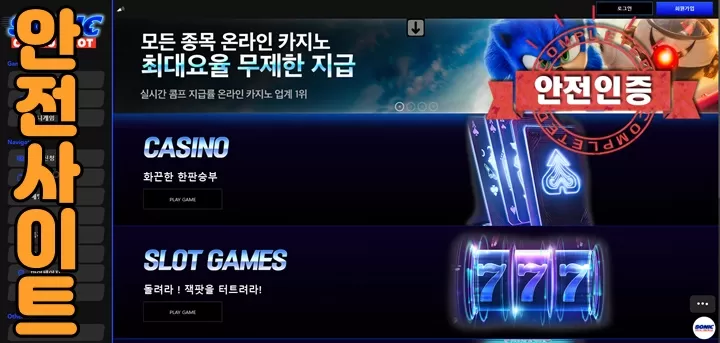여자의 일생 - 7부
여자의 일생 - 7부

말순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싸리해지는 그 무엇이 온몸으로 번져가는 느낌이 든다.
수없이 많은 밤을 한데 어울려 자고
벌거벗은 채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뒹굴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말순의 가슴은 콩닥거리며 호흡마저 끊길 듯 끊길 듯 이어진다.
“하지 말그래이~ ”
덕구는 배에 올려진 말순의 다리를 벌레 쫓듯이 툭 치며 떨어뜨린다.
“우 히 힛!! 더..아니.... 오빠야..... 니이~ 잠 안 자는거 ...내 다 안다....”
말순은 방바닥으로 떨려진 다리를 다시 덕구의 배 위로 올려 놓더니
엄마의 속치마를 슬쩍 걷어 붙였다.
이제 말순의 아랫도리는 훤히 들어나 보인다.
“으 흐 흐 흠~”
덕구는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낮게 내 뱉았다. 그 소리가 가늘게 떨린다.
그리고 방안은 고요해졌다.
이젠 말순과 덕구의 숨소리마져 들리지 않았다.
“흐흡!!”
잠시 뒤, 덕구는 막혔던 숨이 터지듯 짧은 소리가 내 뱉는가 싶더니
몸을 꿈틀거리며 말순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놓았다.
말순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하지만 몸속 깊숙이 감추어졌던 본능으로 인해 말순은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꼴깍!..........으 흐 흐 흐~”
그것은 갈증으로 이어지고 마른 입에서는 침이 삼켜지더니 몸까지 부르르 떨려온다.
덕구의 손이 애벌레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린다.
말순의 몸은 불을 당긴 용광로처럼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으 으 으 음~ 흐으~”
말순은 느릿한 덕구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자
잠꼬대처럼 몸을 뒤척이며 배 위에 올려진 다리를 위로 더 들어 올린다.
그러자 덕구의 손은 미끄러지듯 가랑이 바로 아래까지 와 버리는 것이다.
말순의 모든 촉수는 덕구의 손끝에 쏠려있다.
가랑이 바로 아래에 놓여있는 덕구의 손은 몹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말순의 몸도 이제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왔다.
“으 흡!!!......으 으 으 흠~ 흐으~”
끊어질듯한 숨소리가 귀를 스치는가 싶더니
허벅지 위에 올려진 덕구의 손이 미끄러지듯 움직여 갈라진 그 곳으로 올라온다.
그 순간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던 말순이지만
온몸에서 일어나는 짜리리한 감정에 본능적으로 몸을 꿈틀거렸고
머리는 온통 하얀 백짓장처럼 텅 비어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꼴깍!! 으 흐 흐 흐~ 어엇!!”
그러나 다음 순간 말순은 몹시 허전한 기분을 느낀다.
자신의 도톰한 부분을 덮고있던 덕구의 손바닥은
말순이 기대와는 달리 한번 문지르는 것을 끝으로 떼버리는 것이었다.
“흐흡..... 와? 만제도 개 안 은 데... 흐 으 으~”
“..............”
“흐흣.......개안타 카이~ 내에~ 어메한테 흐으~ 안 이를낀데~ 흐 으 으~”
“흐흡..... 됐 다....흐으~ 그마 자재이~ 흐흠~”
덕구가 돌아눕자 말순은 돌아 누운 덕구의 어깨를 잡아 당긴다.
“오 빠 야~ 흐흠~”
“됐다카이~ 니 보오지 만지믄 흐흣....냄시 난데이~ 그만 자자.............”
나지막하던 덕구의 소리가 나무라듯 소리가 높아지자 말순은 괜히 무안해진다.
“이 씨........ 야아~ 덕구야!! 니이~~~ 씨 프.....내 오늘 목깐....”
말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린다.
둘은 또다시 아무 말이 없다.
“말수이..... 삐 졌 나?”
“............”
“후 후~ 우리 이뿐 말수이가 삐졌구나....”
“내사 인자 니하고 말하기도 싫타....... 말 걸지 말그라.....내는 잘끼다...”
“에이그.....이 등신아~”
“머라꼬? 이 씨.......씨프.... ”
갑자기 덕구에게 등신이라는 소리를 듣자 말순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니는 내 맘을 와 그리 모리노? 이 등신아~”
“씨이~ 내가 왜 니 맘을 모리는데... 내도 다 안데이~ 누굴 바본줄 아나?”
“어 휴.........참 내........후 우~~~”
“봐라..... 할 말 없제? 씨이~”
갑자기 벽을 보고 돌아 누었던 덕구가 몸을 훽 돌렸다.
“가스나야~ 그라믄 내가 니하고...그거해도 개안탄 말이가? 빙시야~”
작은 소리였지만 그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머...머...머 라 꼬? 그..그기라니...?”
“씨이~~ 흐흣.....뚝구 말이다..... 인자 니도 안다매........뚝구...”
“................”
“니는 내 동생이데이~ 그래서 그만 둔기라..... 빙시이~ 등시이~ 바보 같은기....흐흡...”
말순은 할 말이 없었다.
덕구가 저렇게 바로 표현 할 줄은 몰랐고 저렇게 화를 낼 줄은 더 더욱 몰랐다.
확실하게 그것이 뭔줄도 몰랐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말순이었다.
다만 몸이 이끄는대로, 그리고 덕구의 손길이 좋았던 것 뿐이었다.
몸을 만져주고 아랫도리를 비벼 주기만을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동생이니까 안된다니...
그럼 내가 만약 순자였다면 덕구가 내 몸을 만져 주었단 말인가?
철없는 말순은 괜히 순자가 부러워진다.
덕구와 말순은 서로 등을 맞대고 돌아 누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풀벌레 소리도 점점 아늑히 들려오고 산촌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계 시 오~ 퍼뜩 나와 보이소~~ ”
“어이구~ 이거 벌씨 왔구머언~ 어 휴~”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바깥이 무척 소란스럽다.
“에이 씨팔!! 왜 이리 시끄럽노? 누가 찾아 왔는데........”
“아 우 우~ 자부러버 죽겠는데....덕...아니...오빠가...한번 나가 보그라....”
어제 저녁 늦게 잠이 든 탓인지
덕구와 말순은 눈을 비비기만 할 뿐 좀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당은 몹시 소란하며 무슨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린다.
“뭔데.,..저러노? 아 유~~ 아 하 하 함~”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소리에 말순은 기재개를 켜며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다.
“움메야~ 저게 머꼬? 쌀 아이라? 우와~~”

마당 앞 소달구지에 쌓인 쌀가마니를 본 말순이가 놀라며 큰 소리를 지르자
누어서 뒤척이던 덕구는 그 말을 듣자 눈을 번쩍 뜨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니..니 뭐라꼬 그랬노? 쌀이라고? ...........어..어..어디??? 허 허 헉!! 저..저 게??”
덕구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어젯밤 어메가 한 그 말은 꿈이 아니었으며
틀림없이 저 쌀은 말순의 몸값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어..어 메~~~ 아..아 부 지 요.....”
덕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부뚜막에 앉아있던 어메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있으며
마당 한켠에 서 있던 아부지의 눈시울도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
“야아~ 이기 몇 가마니나? 하나...두울...서이...너이...다..”
“주둥이 안 닥치나? 흐흑......비 비 빙시같은 가스나야~ 허 어 헝~~”
말순의 말에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던 덕구가 아부지에게 달려가더니
“허엉~ 아..아부지요~ 이걸로 우리 말수이 파는교? 그런교? 허 어 어 엉~”
하며 아부지의 팔을 잡고 울부짖자
눈시울을 적신 채 먼 산만 바라보던 아부지는 덕구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쌀가마니를 보고 얼굴이 활짝 펴 졌던 말순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자 몸을 움찔거리며 그냥 눈으로 가마니를 세어본다.
- 다섯 가마니다.
이정도면 우리집도 부자일 것이다.
나는 서울로 가서 좋고 우리집은 부자가 되어서 좋을 것이다.
그러나 덕구 때문에 신이나도 신나는 얼굴을 할 수가 없다.
덕구는 어메가 있는 부뚜막으로 가더니 울고있는 어메를 붙잡고 목을 놓아 울었고
소리없이 울던 어메도 통곡을 한다.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지금 우리집은 완전히 울음바다다.
어메와 오빠가 울자 동생들은 따라서 울어버린다.
여섯 살 짜리 갱순이는 부엌 앞에서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울고
세살짜리 막내는 안방에서 앙앙거린다.
이럴 땐 나도 울어야 하는데 그놈의 눈물이 왜 안나오지?
그러는 사이, 안방 앞에 쌀가마니를 모두 내려놓은 그 아저씨는
분위기가 어색한지 잘 계시라는 인사만 남기더니 소달구지를 몰아 휑하니 가 버린다.
말순은 비록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 마음은 무척 들떠 있다.
그러나 이런 때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면 오빠가 또 소리를 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모른 척 하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와 버린다.
말순은 은근히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이러다가 오늘 서울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신나는 이야기를 순자와 점순이에게 자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 씨.... 비만 안왔으믄 되는데....에이~”
한편 부엌에서는 덕구의 원망섞인 울부짖음에 에미의 넋두리가 시작된다.
“어~ 엉~ 엉~ 어...어메.....마..말수이 흐흑...안 가믄 안되나? 어엉~저거 돌래주믄 안되나? 우리 저 쌀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 왔데이....허어엉~ 안 굶어 죽었다 아이가...흑...흑...”
“흑..흑!! 이 에미가 죽일 년이제~ 에미가 죽일 년이야~ 허 어 엉~ 어 엉~ 뱃속에 아만 안뱄어도.....어 어 어~~ 에미 잘못 만나 가지고~~ 에 고~ 허 어 어 엉~”
지난 해 비가 너무 많이와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섯 식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앞으로 다섯달 뒤면 또 하나의 식구가 생긴다는 에미의 이야기다.
보리쌀 마저 바닥이 날 지경에 며칠전 낯선 사람이 집을 찾아왔다.
“저어~ 혹시 여기가 강 말순이의 집이 맞나요?”
“야~ 근데..... 우리 말수이는 우째 아능교?”
“으음~ 제대로 찾긴 찾았네....... 저어~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그 남자는 학교도 다니지 않는 말순이를 데려가 공부도 시켜주고 키우겠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보살펴 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쌀 다섯 가마니와 현금 5천원을 주겠다는 말을 덧 붙였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태산이었던 말순 아부지와 에미는
큰 고민도 해 보지 않은 채 그 낯선 남자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약속까지 해 버린 것이었다.
“흐흐 흑!! 허 어 어 헝~ 우 짜 겠 노....이제 와서...”
덕구는 에미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안의 처지를 아는지라 더 이상 에미를 원망 할 수도 없었다.
“흐흑... 내가 죽일 년이데이~ 덕 구 야~”
오죽하면 딸까지 팔아먹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야기를 듣던 덕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흐흐흑!! 불쌍한 거~ 흐흑...쪼맨한게 무서버 할 낀데...어메...내가 가서 달래주께..”
부엌을 나온 덕구는 뒤안에 있는 샘으로 가더니
흘렸던 눈물을 씻으려는 듯 정신없이 물을 틔기며 세수를 했다.
“말수이...... 니 배 안고프나? ”
“배고파 뒤지겠데이~ 쌀도 많은데..... 와 밥은 안 해주노? 에이그~”
말순의 입에서 쌀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덕구의 가슴이 울컥했지만
말순이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다. 아니 지금은 울 수가 없다.
“해 줄끼다....... 우리 말수이 밥 마이 먹으라꼬 해 줄끼다....휴우~”
“더... 아 휴~ 이거...히 히~ 오빠야~ 우리 인자 부자제? 우 히 히~”
덕구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처럼 웃고있는 말순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그래....... 인자 우리는 부자데이~ 마..말수이.....니 때문에....니...니 때문에...흐흡!!”
“에이 씨~ 순자한테 자랑을 해야 할낀데........씨이~ 오빠야~ 오늘은 선녀탕에 몬 가겠제?”
“이 등신아~ 흐흑!!”

덕구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되자 말순을 와락 끌어 안는다.
속치마의 어깨끈만 걸쳐있는 말순의 얄팍한 어깨가 오늘따라 더욱 약하게 느껴진다.
“치이~ 와 우노? 오빠야~ 니 요즘 이상테이~ 남자가 자꾸 울기만 하고....”
하지만 말순은 무척 기분이 좋다.
욕만하고 못살게 굴기만 하던 덕구가 이토록 자기를 좋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덕구의 품에 안긴 말순은 무척 포근하고 행복했지만
말순을 안고있는 덕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린다.
-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