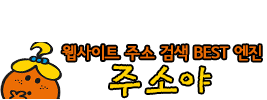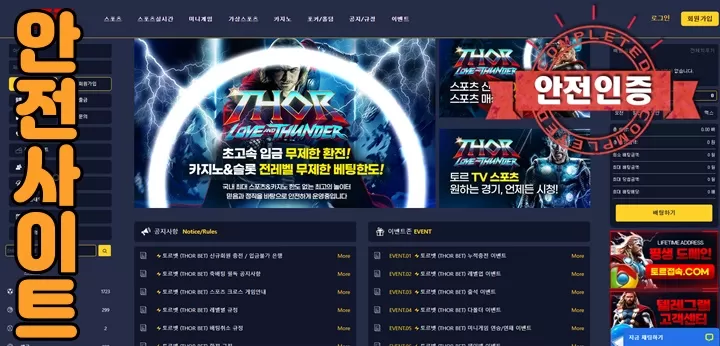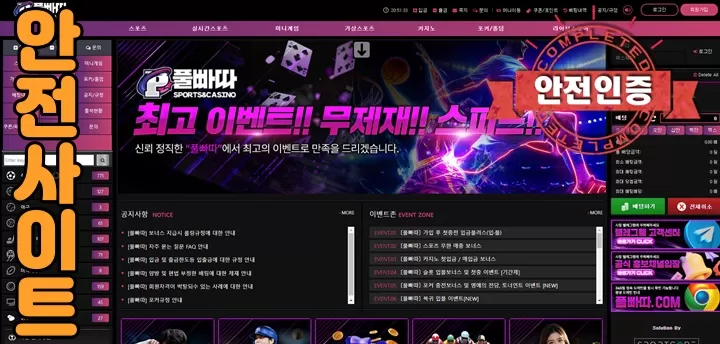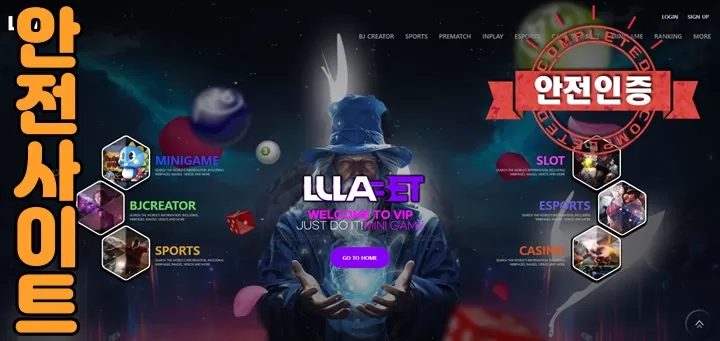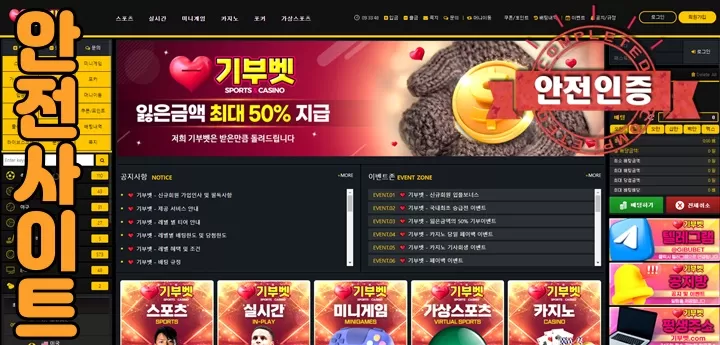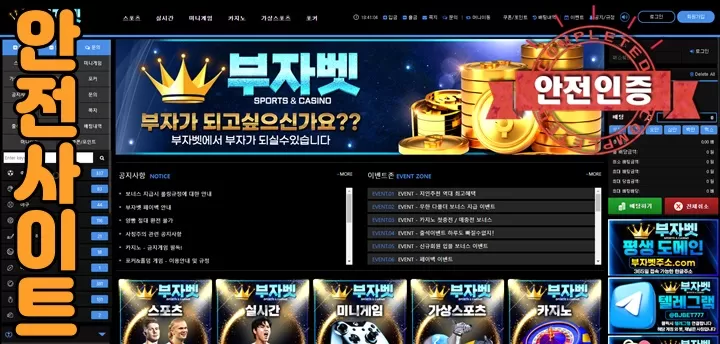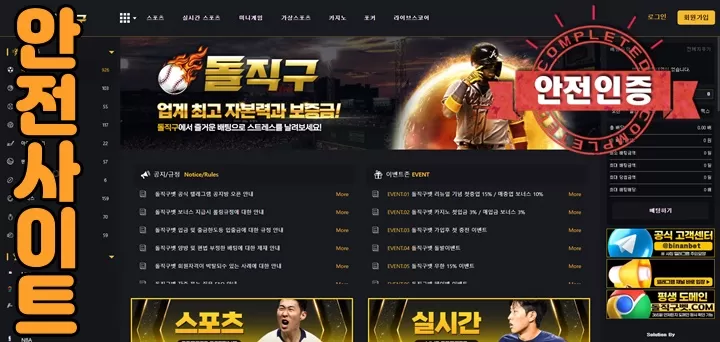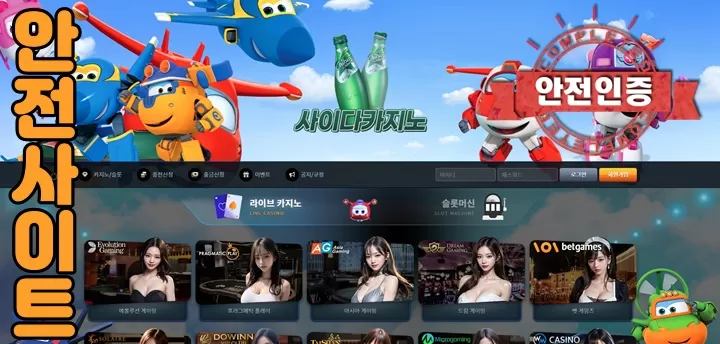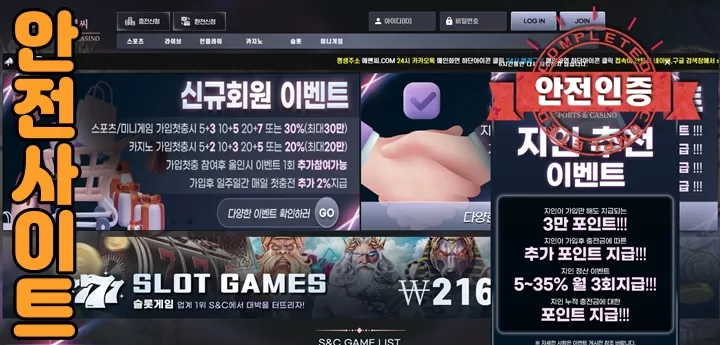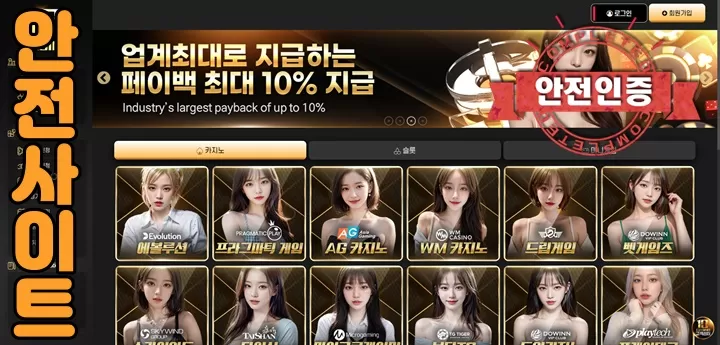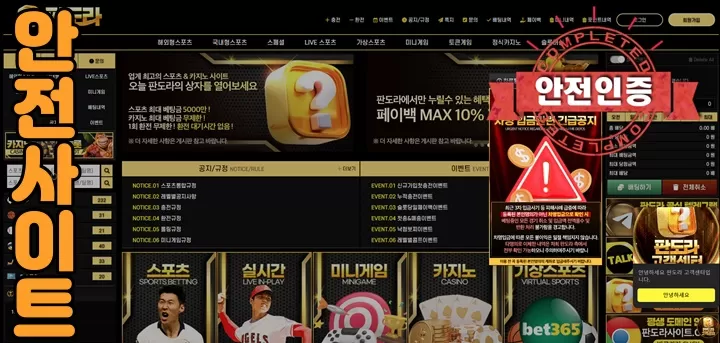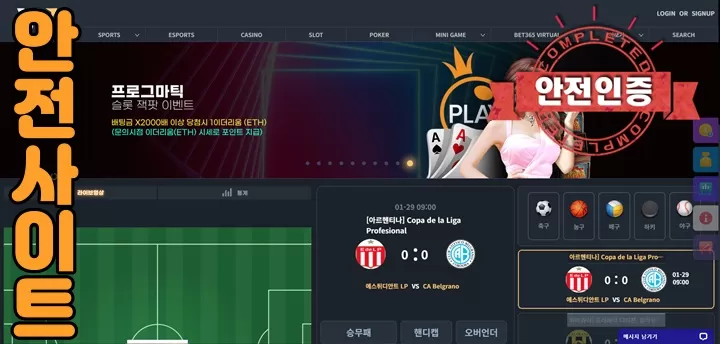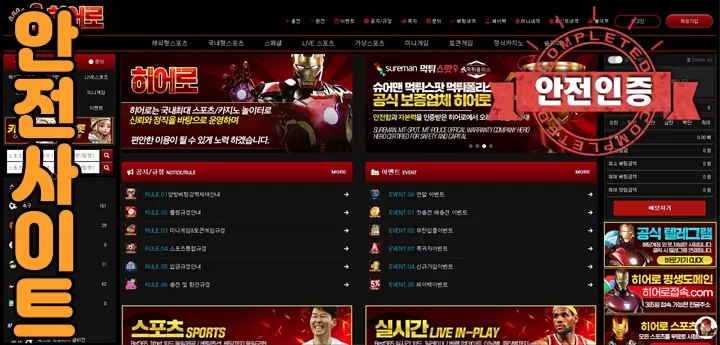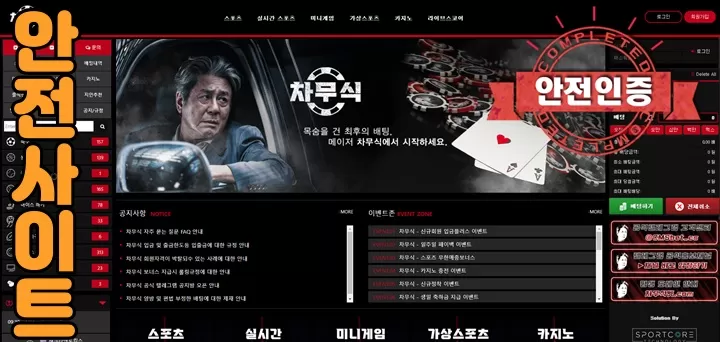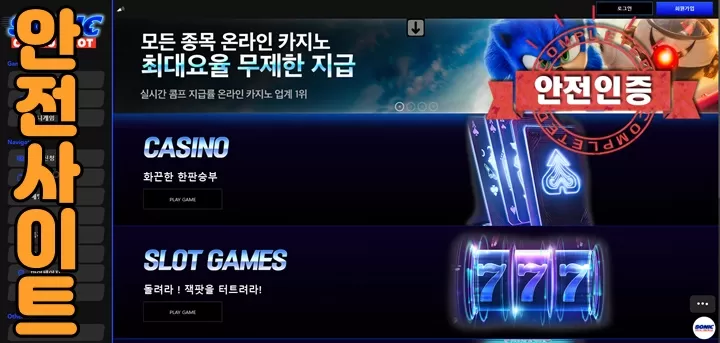여자의 일생 - 6부
여자의 일생 - 6부

듬성듬성 몰려다니던 구름도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자 하늘은 마냥 푸르기만 하고
비가 그친 뒤 라서 그런지 해가 넘어가는데도 후덥지근한 날씨는 온몸을 땀으로 적셔버린다.
말순은 엄마의 속치마가 마음에 드는지 다 마르지 않은 마당을 뛰어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말순아이~ 저녁 먹어야제? ...... 덕구... 나오라고 그래라~"
부엌에 있던 어메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말순을 부른다.
밥상에는 역시 보리쌀이 드문드문 섞인 밥 한 그릇이 놓여있다.
"어메야........ 왜 자꾸 말수이 한테만.... 쌀밥 주는데? "
한 두번도 아니고 매 끼마다 말순의 밥그릇이 다른 것을 보며 그동안 아무 말도 않던 덕구가 한마디 한다.
"그..그건...기...기냥... 저 어~"
말순 애미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질 못하고 우물거리더니 도와 달라는 듯이 말순이 아부지를 쳐다본다.
"야 이놈의 새끼야~ 쳐 먹기 싫으믄....안 먹으믄 되제....저 늠의 새끼가 배떼기가 불러 놓으께네..."
설마 아부지까지 편을 들고 나설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덕구가 눈이 휘둥그레 진다.
"더..덕구...아..아 이 다... 오..오 빠 야~ 이거 묵을래? 내는 개안타~"
아부지와 어메의 눈치를 살피던 말순은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 미안했던지 하얀 밥그릇을 덕구앞에 밀어 놓았다.
"아..아..아이다..... 기양........ 니가 먹어라.... 저녁인데 밥 묵는 것만 해도 어딘데...개안타~"
밥상머리의 분위기가 어두워지자 어린 동생들은 어메와 아부지의 얼굴만 번갈아 볼 뿐
잠시 방안은 침묵이 흘렀다.
"어 메............ 그란데..... 내 언제 서울 가노? "
적막을 깨는 말순의 이 한마디,
덕구는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고 어메의 얼굴에는 금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어..어메... 말수이가 서울을 간다니??? 그게 무신 말인데?? 으응....어메야...."
"오빠야 몰랐나? 나 인자 쪼매만 있으믄 서울 간데이~ 우히히~ 그래서 요새 나한테만 쌀밥 주는기라..."
"어..어메...정말이라? 어메... 아부지요~ 그기 정말이래요? 말수이가 서울가는기 정말이래요?"
덕구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자 말순 애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고
말순이 아부지는 들었던 숟가락을 밥상에 놓더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 보며 한숨을 쉰다.
"어..어메~ 말수이가 서울을 왜 가는데? 식모로 가는기라? 저 쪼맨한 것이... 시..식 모 로?? 흐흑..."
덕구의 목소리가 끊기듯이 흐느끼자 고개를 푹 떨구었던 말순 애미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더니
그 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피가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흐흑...어..어 메 야~ 아..안된데이...저 가스나는 흑..흑..아즉 너무 어리데이... 너무 쪼맨하데이... 흐흑..."
맨날 욕을 해 대며 또 어떤 때는 때리기 까지 하던 덕구가 자신이 가는 것이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다니...
말순은 너무나 의아했다.
그리고 어메와 덕구의 눈물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다.
"개..개 안 타 .... 오빠....내 ...증말 힘 쎄데이~ 흐흑... 내... 일 잘 할끼다... 흑..흑...증말이다...어 헉..."
"바보 같은게... 흑...식모가 얼매나 흐흑...힘드는줄 니가 아나?...흑..."
한동안 천장만 쳐다보던 아부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벽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서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허 어 헝~ 아이고...흐흑...말순아~ 허엉~ 헝~ 시..식모라믄 얼매나 좋겠노....어 엉...헝~"
밥상머리 앞에서 어깨만 들썩이던 말순 애미가 갑자기 말순을 끌어 안으며 통곡을 해 대는 것이었다.
식모라면 얼마나 좋다니?
그렇다면 식모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단 말인가?
말순은 어메의 품에 안긴 채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은 어메의 가슴에 얼굴이 묻혀버리자 숨이 막힐 뿐이었다.
"밥 묵다가 이게 머 하는 짓이로? 당장 안 그치나? 밥 쳐 먹기 싫으믄 전부 먹지 말고..."
그동안 아무 말이 없이 벽만 쳐다보던 아부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모두들 움찔 하면서 울음소리를 낮춘다.
방안은 무서우리 만큼의 정적이 감돌았다.
"묵자..."
아부지가 밥상머리로 몸을 돌리면서 짧은 한마디를 내 뱉자
어깨만 들썩이던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밥숟가락을 들었다.
겨우 보리밥 반 그릇을 비운 덕구는 휑하니 안방을 나가버리고
말순이도 아부지의 눈치를 슬글슬금 보더니 밥숟가락을 놓아 버린다.
"덕...아니...오 빠 야~ 니... 배 안고프나? 밥도 쪼매만 먹고...."
덕구의 뒤를 따라 온 말순은 방을 들어서면서 생긋이 웃어 보인다.
"으응~ 내는 안 고프다... 니나... 마이 먹지 왜?"
"내도... 배가... 안 고프드라... "
말순은 덕구 옆으로 다가가 탈싹 주저 앉아 덕구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본다.
그렇지 않아도 덕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따라 덕구의 모습이 왜 그리 멋지고 늠름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히 히~ 오빠.... 니 증말 잘 생겼데이....우 히 히~"
"가 스 나... 니는 남의 집에 가는데 걱저옫 안되나? 빙시 같은기..."
"히히~ 개안테이.... 내 돈... 마이 벌어서 .... 집에 올때... 오빠야...옷도 사 올끼구먼...히 히~"
"가스나...누가 니보고 ..옷 사달라 켔나? 빙시 가스나... 휴우~ "
덕구는 가슴이 답답한지 한숨만 나오는데 철없는 말순은 아직도 덕구의 얼굴만 쳐다본다.

"우 히 히~ 울 오빠야..증말 멋지데이~ "
"어 휴~ 이 가스나... 니도 사실은 이쁘데이....증말 이쁘데이~"
덕구의 말을 듣자 말순의 얼굴의 입이 찢어 질 것만 같았다.
그것은 오빠에게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증말이가? 우 히 히~ 오빠야... 증말 내가 이쁘나? 히 히 히~ 아 구 구 구~ 히히~"
"그래...이 간나야~ 순자 보다가도 백배 천배 더 이쁘고... 내가 학교 댕길때 희연이 보다도 훨씬 이쁘데이~"
말순은 덕구의 말에 엉덩이가 몇 번 들썩거리더니 기여코 덕구를 와락 껴 안는다.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 이 가스나가 왜 이래노? 저리 안 비키나? " 라고 했을 오빠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말순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갱수이는 안방에서 잘라카나? 왜 안 오는데.......... 갱 순 아 이~ 갱 순 아~"
"벌써 자는갑다... 나 둬뿌라........ 그 오줌싸개 가스나..."
하긴 경순이는 하루라도 오줌을 거르는 날이 없다.
어떤 때는 싸 버린 오줌이 덕구의 옷이나 말순의 옷까지 적실 때도 있었다.
물론 그런 때는 경순이가 너무 미워서 꼬집기도 하고 쥐어 박기도 하지만
막상 오늘같이 안방에서 잘라치면 웬지모르게 경순이의 빈자리가 허전하게 생각된다.
"아이고~ 내는 오줌이나 누고 잘란다.... 오빠야~ 니는 오줌 안 누나?"
"..................."
덕구가 대답을 하지않자 말순은 혼자 어두워진 마당 한 구석으로 나가더니
어메의 속치마를 덜렁 들고 쪼그려 앉으며 속치마가 바지 보다 참 편하다는 생각까지 한다.
"쏴 아~~~"
항상 오줌을 눌때 느끼는 일이지만 쏴아 하는 소리가 날땐 무척 기분이 좋다.
오줌을 다 눈 말순은 어두운 가운데 무엇인가 찾고 있다.
밝을 때면 세찬 오줌줄기에 땅이 옴폭하게 파 지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다.
속치마는 끌어 올리지 않아도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면 그만이다.
말순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한 옷을 두고 바지를 입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오빠야~ 자나? "
"..................."
"안 자는거 아는데... .... 내 하고 말하는게 싫나?"
".................."
"씨이~ 거짓뿌렁이제? 아까 내 보고 이뿌다고 했는거...그거 ..거짓뿌렁이제? 씨이~"
"이 뻐........... 말 수 이 ......니는 증말..... 이뻐....."
덕구는 돌아누우며 이쁘다는 소리는 잊질 않았다.
덕구는 떠나간다는 동생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무엇이 솟아 올라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니 말을 해 버리면 금방 울음이 터져 나올 듯 했다.
가슴 한구석이 빈 것처럼 왜 이리 짜리리 해 오는 것일까?
덕구는 돌아 누운 채 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뿐이다.
"오 빠 야.........자 나?"
"으응.... 나 잔데이~"
"그짓말... 자믄서 으떻게 말을 하노? 아 하 함~ 오빠야...니도 잠이 안 오제? 기냥 하품만 나온데이..."
"기냥 자..... 눈 감고 있으믄 ... 잠이 ...올끼다...휴 우~"
시간이 갈 수록 덕구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는데
곁에 누워서 눈만 말뚱거리던 말순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몸을 뒤척이는 척 은근슬쩍 한쪽 다리를 덕구의 다리 위로 올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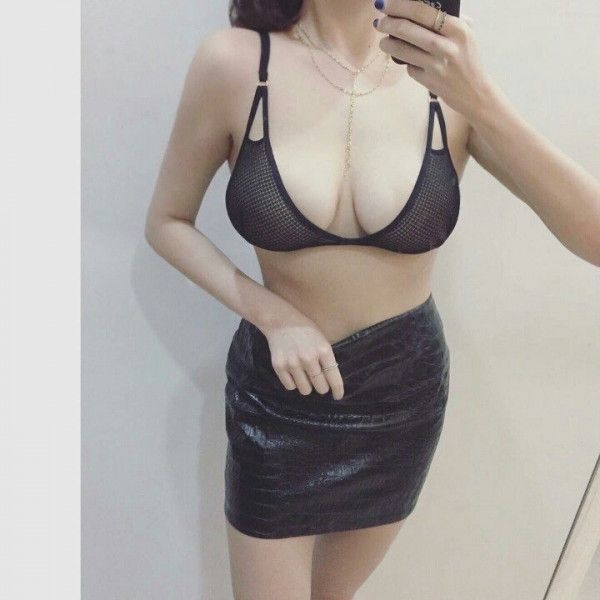
그러나 덕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말순은 다시 다리를 더 들어 올려 윗옷을 벗고 누어있는 덕구의 배에다가 걸쳐 놓았다.
덕구의 뱃살이 무척 보드랍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순의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