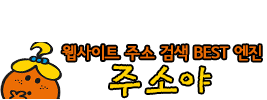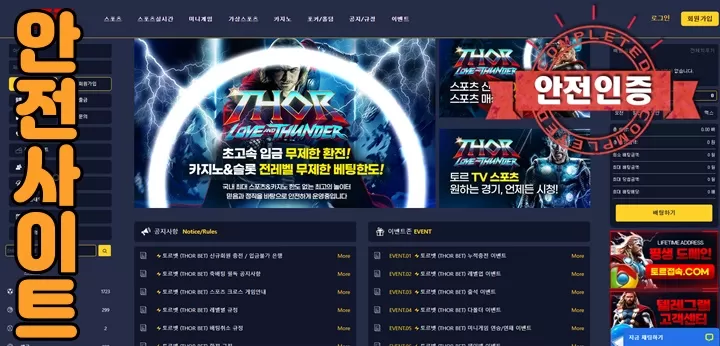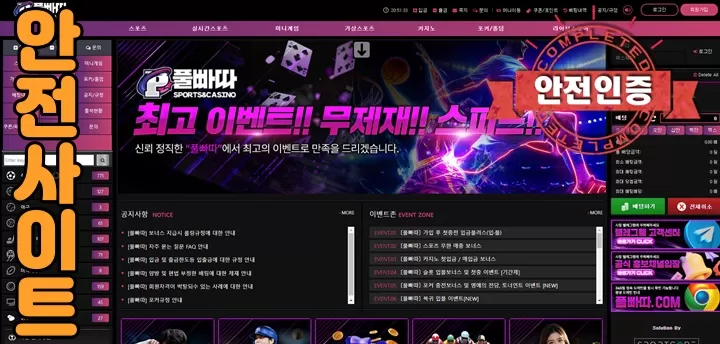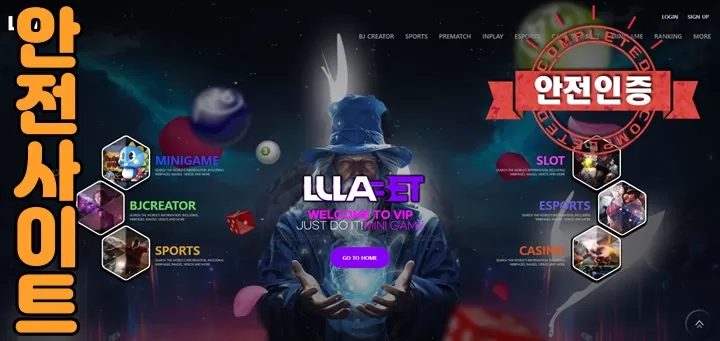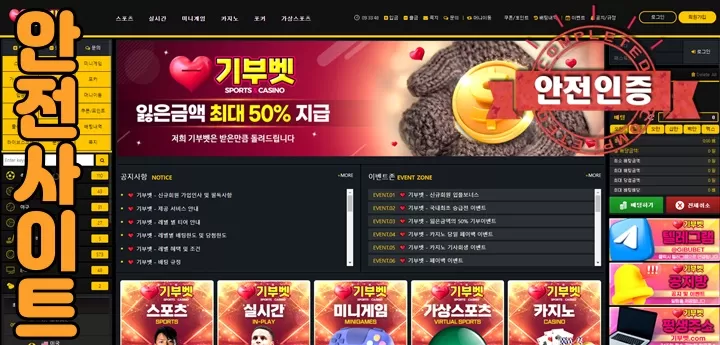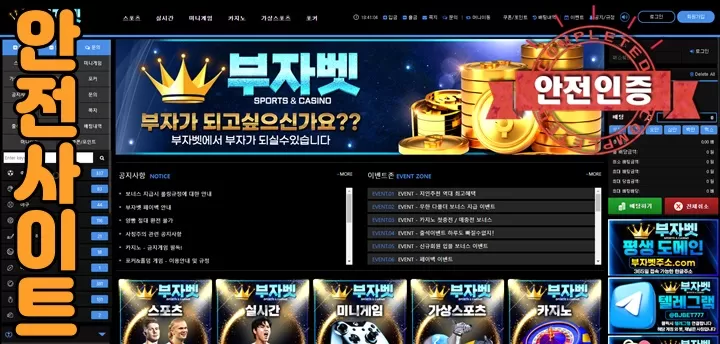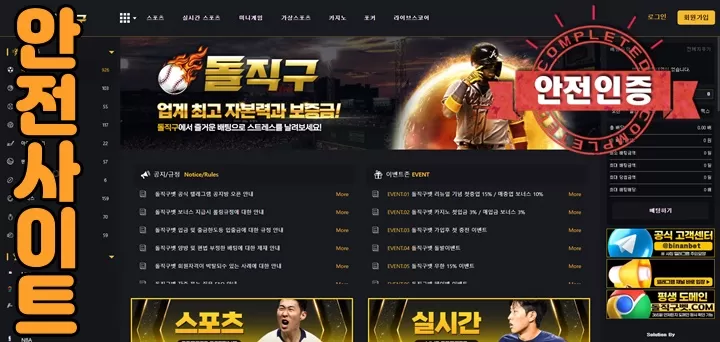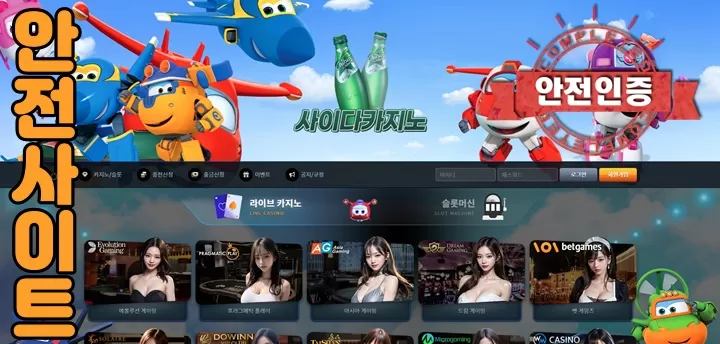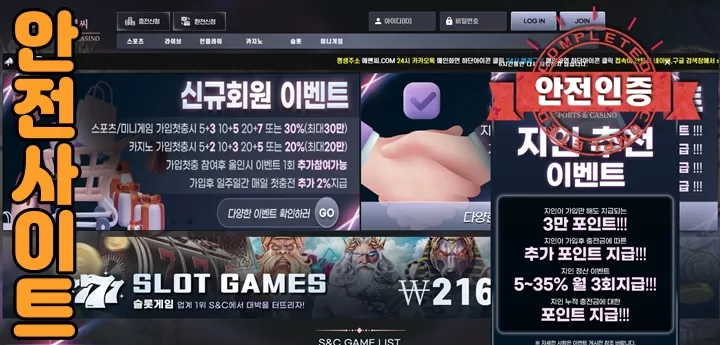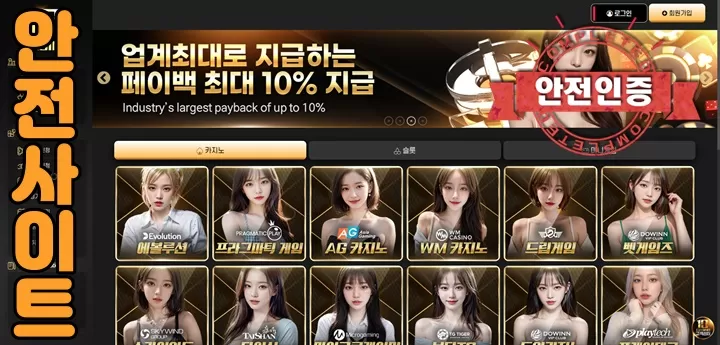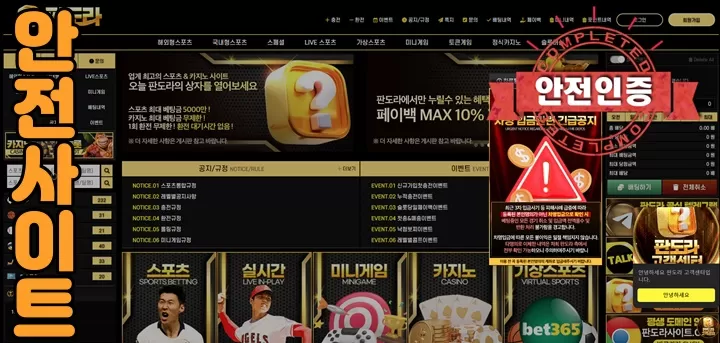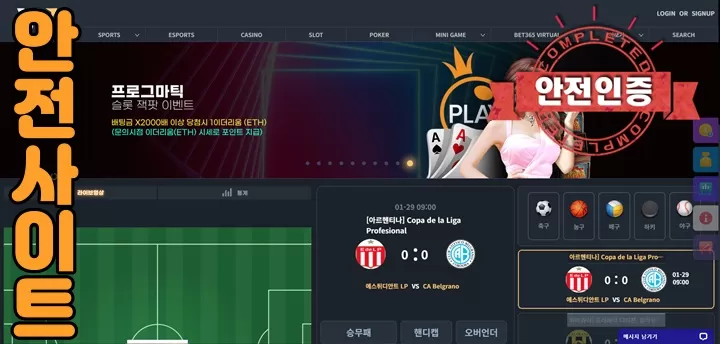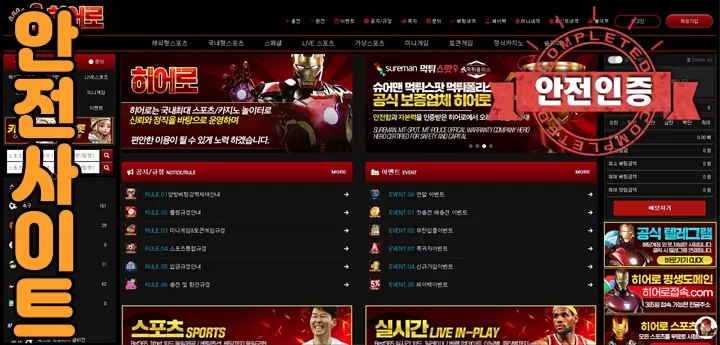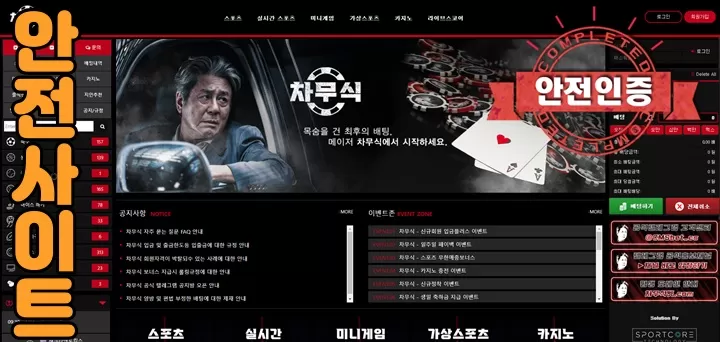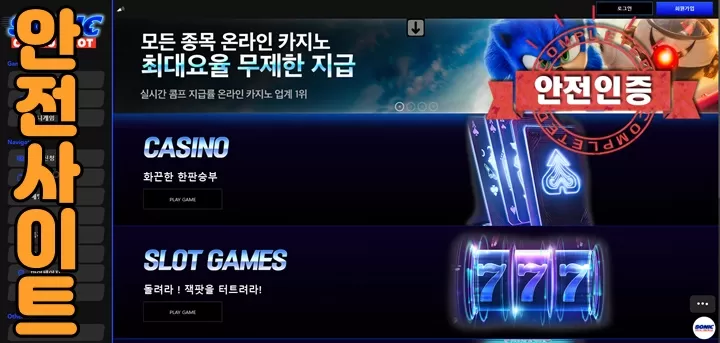여자의 일생 - 4부
여자의 일생 - 4부

"우메~ 먼놈의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노? 에이~ 오늘은 놀러가기..."
혼자 하얀 쌀밥을 먹었던 말순은 괜히 미안했던지 쏟아지는 비를 보며 궁시렁거리다가
놀러 라는 말이 툭 틔어 나오자 괜히 야단을 맞을 것 같았던지 어깨를 움찔하며 엄마의 눈치를 살핀다.
"글쎄 말이다~ 날이 좋아야 우리 말수이가 선녀탕에 놀러 갈낀데...에이고~ 저놈의 비는 언제 그칠라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야단은 커녕 오히려 걱정까지 해 주다니...
말순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엄마를 봤다.
입을 딱 벌린 말순의 모습은 마치 바보같아 보인다.
엄마의 모습은 무표정하다. 아니 어쩌면 수심에 가득차 있는 것 같다.
매일 야단만 듣던 말순은 오히려 위해주는 엄마가 더 부담스러운지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버린다.
"참내 이상도 하제... 야 말수나~ 니 생일이 언제로? 혹시 오늘이 니 생일 아니라?"
뒤를 따라오던 오빠 덕구도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내 생일? 그란걸 내가 우째 아노... 덕구 니는 니 생일 아나?"
"내도 모르지... 흐흠~ 진짜로 이상하데이~ 니 혹시 무슨 일인지 모리나?"
무슨일....무슨일이라...
말순은 그 순간 어젯밤 그 일이 머릿속에 떠 오른 것이었다.
"맞다...맞어~ 어젯밤에 내가 오줌누러 나갔다가 들었는데...."
"오줌누러 나갔다가 들었다이...그게 먼 말이고?"
말순은 어젯밤 엄마의 통곡소리와 아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귀에 아련히 남아 있었다.
"어젯밤에 어메가 울믄서 나를 어데 보낸다고 하던데... 아부지도 ..."
"말도 아이다...니 같이 쪼끄만 아를 어데 보낸다꼬... 흐흐흐~ 혹시 니~ 시집가는 거 아이라? 히 히~"
"머라꼬? 덕구 니 씨 프~~"
막 자란 말순의 입에서 무언가가 틔어 나올 뻔 하다가 차마 오빠라서 욕은 하지 못했지만
시집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어젯밤 어메와 아부지의 벌거벗은 몸이 생각나 몸이 부르르 떨린다.
"아이다... 내 같이 쪼끄만게 우째 시집 가는데... 으 흐 흐~ 안돼...내는 몬 해..."
"히히~ 옛날에는 9살만 되믄 시집을 갖다 카드라... 흐 흐 흣..."
덕구의 놀리는 소리가 이어지자 말순은 아부지의 커다란 자지가 떠 오르며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다... 내는 몬한데이~ 그라믄 얼매나 아픈데...흐흑... 아 이 다...."
"머를 몬해? 기냥 시집을 가믄 되는기지... 비엉신~"
"치 니는 아무꺼도 모르니께 그렇제... 시집가믄 뚝구도 해야 하는기라...그기 얼매나 무서븐긴데..."
"뭐어?? 뚝구? 니가 뚝구를 우째 아노? 그기 먼지도 모르믄서..."
"왜 모르는데... 내도 다 봤데이~ 그거...으읍.... 아..아..아이다..."
말순은 덕구가 모른다고 무시를 해 버리자 어젯밤 그 일을 이야기 하려다가 손으로 입을 막아 버렸다.
"니가 봤다꼬? 어데서 봤는데? 말해봐... 니 말 안하믄 어메한테 일러 준데이~"
말순은 무척 당황스럽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을 다물어 버리려니 오빠의 협박이 무섭다.
"으 음~ 사...사 실 은.... 어젯밤에.... 내가 오줌을 누러 나갔는데............"
말순은 더듬거리며 어젯밤 엄마와 아부지의 행위를 이야기 하였다.
"정 이라? 니가 정말로 그걸 봤단 말이라? 우와~ 내도 깨우지...으이 씨~"
덕구는 그 재미난(?) 광경을 보지 못한게 못내 아쉬운지 몸을 흔들어 가며 투덜거린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는 그칠줄 모른다.
일은 하지 않아도 좋지만 막상 놀려고 하니 마땅히 놀거리가 없는 덕구와 말순은
방구석에 등을 붙이고 이리뒹굴 저리뒹굴거리기도 진절머리가 나는 듯 했다.
"에이 씨... 웬놈이 비가 이리도 마이 오노... 그자 덕구야?"
"그래~ 비가 오는데도 집구석에만 있으이 무진장으로 덥네...으히유~"
덕구는 덥다며 윗통을 벗어버린다.
말순은 무심코 덕구와 같이 따라 벗으려고 찌든 난닝구를 들쳐 올렸다가
문득 어젯밤 아부지와 어메의 생각이 나자 덕구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다시 스르르 내려버린다.
"와~ 니는 안 덥나?"
"으 응~ 아이다... 고롷게 덥지는 안데이~ 기냥 참을만 하다..."
한동안 그들에게는 침묵이 흘렀고 덕구는 벽쪽으로 몸을 돌려 버리자
마당에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순은 웬지모르게 마음이 심란해 진다.
"잘라꼬? "
"응~"
"자지 말고 기양 내 하고 놀믄 안되나?"
"가스나 하고 뭐 하고 노노? 내는 기냥 잘란다."
말순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된 덕구의 번들거리는 등짝을 한동안 보고 있었다.
이젠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덕구,
그리고 그 무지막지 한 오빠의 욕지꺼리도 어쩌면 말순에게 그리울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말순의 눈에는 어느새 이슬같은 눈물방울이 맺혀오고 있었다.
"말수이...니 바지... 어 어~ 니 울었나?"
벽을 보고있던 덕구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말을 하려다가 울고있는 말순을 보며 놀란다.
"아..아..아 이 다~ 미칬나? 내..내가 왜 울어..... "
"니 우는 거 아이라? 봐라...눈물이 나왔잖아~"

말순은 얼른 손등으로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을 훔치며
"아이라 카이~ 누..눈에 머가 들어갔나 벼~ 후 울 쩍...근데...내 바지가 왜?"
하며 막혀있던 코를 훌쩍 삼켜버린다.
"으 으 응~ 그..그거... 그..그게 아이고... 니 ...바지 하..한번만 내려 보라고..."
"머라꼬.... 내 바지를? 이기 매쳤나? 내 바지를 왜 내려? "
"아..아..아 이 다...기냥 한번 해 본 소리다...안 내리도 개안타~"
말순이의 큰 소리에 덕구가 무안했던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른 몸을 돌려버린다.
괜히 미안하다. 물론 바지를 내리라고 했던 덕구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얼굴까지 빨개져 버린 덕구를 보자 말순은 마음까지 찌르르 해 진다.
까짓것 선녀탕에 가면 하루종일 발가벗은 채 뛰 노는데 그 정도의 부탁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오...오 빠 야~"
처음으로 덕구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말순이다.
"........................"
덕구는 무안한지 아무 말이 없다.
"오 빠 야~"
"으 응~"
"바..바 지.... 내 려 주 까?"
말순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다.
덕구가 대답이 없자 자신도 모르게 바지를 내려 주겠다는 말이 틔어나온 것이다.
"아 이 다~ 개 안 타~ 인자 다 됐으이깐~ 내는 그만 잘란다..."
덕구의 등만 물끄러니 보고있던 말순의 입이 실룩거린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덕구와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다.
말순은 누운 채 마당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몸을 벌떡 일으켜 방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바지의 단추를 끌렀다.
"오...오 빠 야~ 봐라... 얼릉~ "
"에이 씨팔....잘끼라니...허헛!! 마..마..마 말 수 이 ...니이~"
말순이는 빨간 고리땡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자그마한 두 손으로 앞을 가릴 듯 말 듯 하는 것이다.
다른 곳 보다가 유난히 하얀 말순의 아랫도리,

그 곳은 맨들거렸고 살이 있는지 약간 도톰 하였으며 가랑이 바로 위에는 칼로 베어 놓은 듯 했다.
"선녀탕에서 맨날 보믄서 머가 그래 보고 싶노? 얼릉 봐래이~ 갱수이(경순: 말순의 바로 밑의 동생) 올라..."
"으 흐 흐~ 돼..돼..됐다...인자 그만 올리그래이~ 흐으~"
덕구는 말까지 더듬으며 손이 멈칫 하다가 침만 꿀꺽 삼키고는 그만 두었다.
하지만 덕구의 눈은 말순의 거시기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만지고 싶나? 그라믄 얼릉 한번 만지고..."
"아..아..아 이 다... 그만 올리그래이~ 인자 됐다..."
말순은 누운 채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더니 허벅지까지 내려졌던 바지를 끌어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말순의 눈에는 덕구의 아랫도리가 불룩히 솟아오른 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우 히 히~ 더..덕....아니~ 오..오빠야...꼬치 꼴렸제? 히 히 힛!!"
"에 이 씨~ 아이다...안 꼴렸데이... "
"그라믄 어데 보여줘 봐라~ 우 히 히~ 꼴렸으믄서... 키 킥!!"
"저 씨 파.... 에 이~ 모르것다...내는 그만 잘란다... 인자부터 내 한테 말 시키믄~ 뒤진데이~"
"키 키 킥...키득...키득..."
틀림없이 덕구가 자신의 아랫도리에 손이 올 줄 알았던 말순은
물론 자신의 거시기에 손을 댔다면 무진장 창피 했겠지만 그냥 바지를 올리라는 덕구가 조금은 서운했다.
"아 하 함~ 하 아~ 아유~ 내도 잘란다..... 비오니께~ 놀러도 몬가고... 아 하 함~"
말순은 덕구와 반대쪽으로 돌아누우며 잠을 청한다.
지금이라도 비가 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놈의 빗줄기는 남의 속도 모르고 점점 굵어져만 가고 있다.
-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