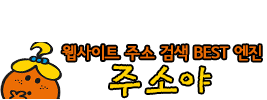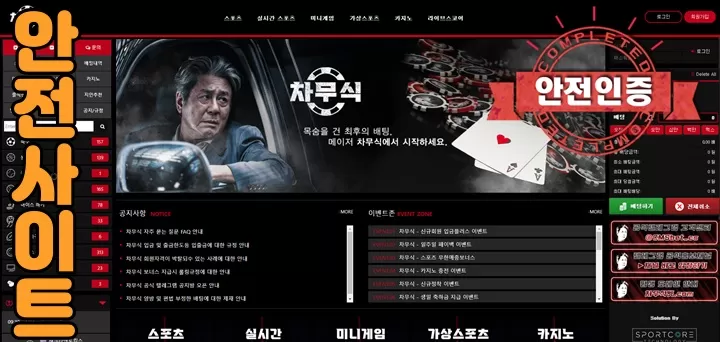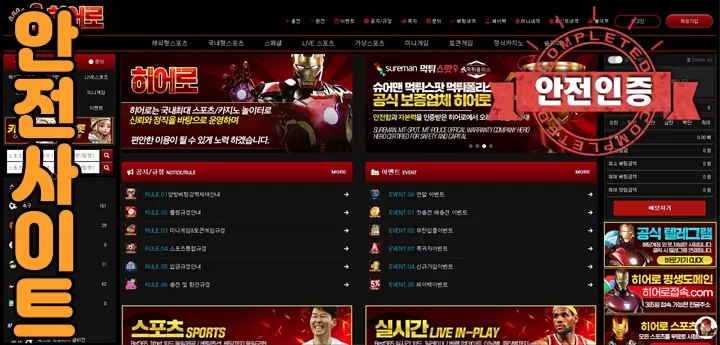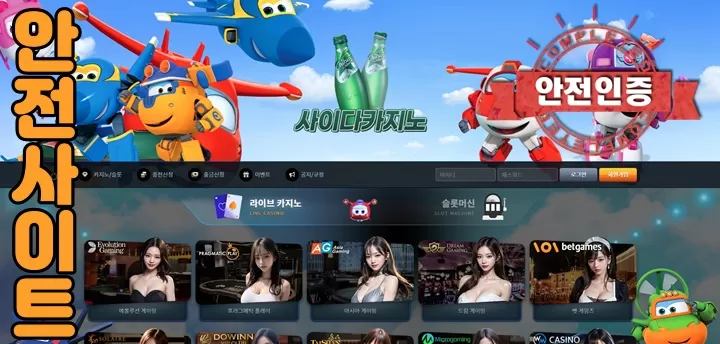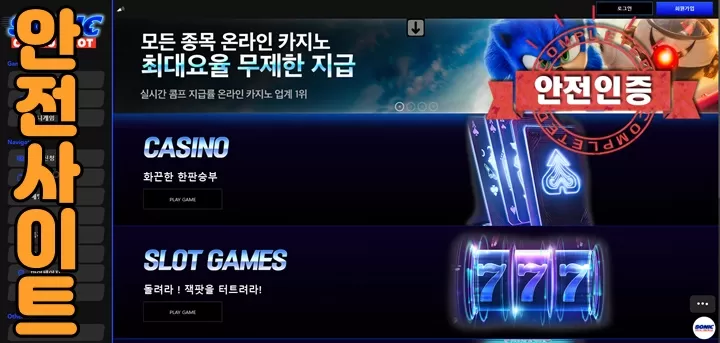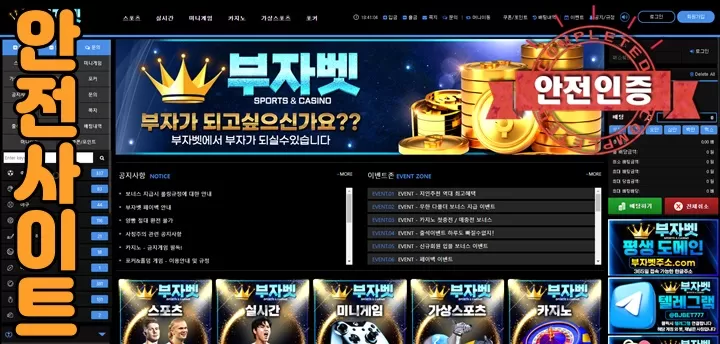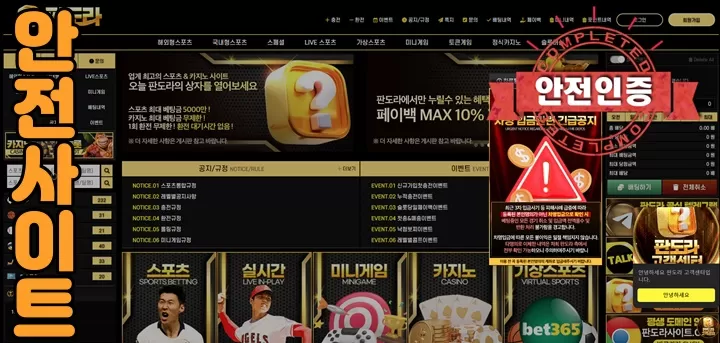야화 42화
야화 42화
"시숙은 그럼 타구삼절초(打狗三絶招)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가르치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뭐가 다른데? 어디 그럼 타구삼절초를 시전해봐"
"히히히...네 놈들이 흉내나 낼 수 있을 것 같으냐?! 타단구퇴(打斷狗退)! 구구입동(狗口入洞)! 취구버신(醉狗飜身)!..."
과연 개방의 독문 무공이며 무림의 고수가 시전하는 절초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뒤집힐 만 하였다. 의기양양해진 얼굴로 취아선이 두 남녀를 돌아다 보았다.
"호호호... 거지같은 무공은 과연 거지 같잖아! 두 번 볼 것도 없네! 타단구퇴, 구구입동 취구번신"
의기양양해 하던 취아선의 얼굴이 코를 푼 휴지조각처럼 구겨졌다. 더 이상 완벽 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화 풀이는 다른데 가서 했다.
"네 놈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한 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소?! 다만 흉내를 내 보라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어디 흉내라도 상관 없으니 한 번 해 봐라! 틀린 데는 이 노형이 가르쳐 주마"
"그럼 흉내라도 내 보겠소? 타단구퇴! 구구입동! 취구번신!..."
얼핏 보기에는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런데 춤사위 같은 그 유연한 동작 속에, 타구 삼 절초의 진수가 알알이 녹아 들어 있었다.
"에잉 빌어먹을 놈들... 아아~ 이제 우리 늙은이는 죽는 일만 남았도다"
"호호호...벌써 죽으면 어떻게 해! 천지합벽(天地合壁) 18초식을, 훔쳐 봐야 할 것 아냐?"
"에잉! 너희들이나 실컷 해 봐라!"
훌쩍 자리를 털고 일어나,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사라지는데, 그런 그의 그림자 속에 함녕 공주의 그림자가 녹아 들어 갔다. 만약 훔쳐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눈깔을 후벼 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속 치마를 입지 않았으니 그냥 걷어 올리고 무릎 위에 올라 앉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숲이 흔들리고 범이 으르렁 거리고 당나귀가 히힝거리는 것이 몇 차례 반복 되었는지 모른다. 하늘이 내려다 보다가 침을 흘렸는지 후드득후드득 빗방울이 듣기 시작을 하였다.
"아아~ 시어미 죽고 처음이라 더니,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것을..."
"하하~ 발광을 하려는 이 놈을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모른다오"
"그나마도 황이 곁에서 지켜 주었으니 그만큼 견뎌 냈지, 나 혼자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에요"
"나는 그대가 역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고 정신이 없었다오"
"호호호... 우리 몸이 보통 몸뚱이인가요. 황이 10여 년 동안 집어 먹고 물리고 쏘이고 한 독들이 모이고 모여 일종의 면역체를 이루어서, 다른 독이 몸 안에 들어 오면 순식간에 중화 시키는데, 다른 병균이라고 쉽게 들어 올 수 있나요?...황이 의술을 알고 있었기에 그나마 그 정도로 수습 된 것이에요"
"천지합벽을 할 시간만은 소중하게 남겨 둡시다"
"호호호... 거지 늙은이가 엿 보면, 눈알을 뽑으려고 했더니, 얌전히 물러난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것 없소! 개방이 자랑하는 독문 무공을 그냥 한 번 본 것 만으로, 완벽하게 시전을 했으니, 충격이 컸을 것이오"
"만류귀종(萬流歸宗)이라는 이치를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입신지경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언감생심(焉敢生心) 꿈이나 꾸어 보겠어요. 하지만 무공은 언제나 황 보다 한 수 뒤지니 왜 그렇지요?"
"그야 나는 눈을 뜨면 사냥을 하느라 산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으며,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그 모든 것이 무공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니, 무공 밖에는 모르는 생활을 해 왔고, 그대는 무공 보다는 의술이다 학문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배워야 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소. 그 보다는 이제 거지 노인을 그만 놀리는 것이 어떻겠소?"
"황은 내가 그 노인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 해요? 평생을 가족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노인이 친 손자 손녀 같으니까 우리에게 정을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노인네가 왜 우리 곁에 붙어 있겠어요? 내가 놀려 주지 않고 얌전을 빼 봐요? 공주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막 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가 서먹서먹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아아 그러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기미(機微)에 대해서는 아직도 맹탕이니, 그 때 그 때 꼬집어 가며 가르쳐 주구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지만, 진심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에요.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것은 좋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 내 보이면, 서로가 조심을 하게 되는데, 체면을 생각하고 싫은 것도 좋은 척 한다면, 상대방은 좋은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하하하... 찰거머리라는 쐬기를 박았기 때문에, 그 늙은이가 자리를 피해준 것이겠구려"
"호호호... 거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두 사람이 모두 찰거머리 찰거머리 하면 듣기 거북하고 싫겠지만, 황은 언제나 노형님 하며 깎듯이 대접을 하고, 나만 놀려대니,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것이지요"
"참으로 인간 관계란 어려운 것이로구려. 나는 이번에 새로 거두어 들인 일곱 사람의 수하를 그대가 다루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오"
"그것도 서로가 진심이 통한 것 뿐이에요. 다만 아랫것들을 많이 거느리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수하를 거느리는, 윗 사람의 태도가 몸에 베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요"
"우리들의 미래가 기대 되는구려"
몇 달만에 태산 산중의 집 안으로 들어 서려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뚝 멈춰 섰다. 마당 한 가운데에 바짝 마른 다 죽어가는 금전표(金錢豹=표범) 한 마리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간 해서는 사람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금전표가, 사람 냄새가 베어 있는 민가에 내려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 발 소리를 들은 금전표가 눈을 뜨더니 천 풍림의 눈과 마주쳤다. 풍림의 눈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금전표가 힘 없이 사르르 눈을 내리 감았다.
"봉! 조용히 나가서 토끼 한 마리만 잡아다 주겠소?"
풍림이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금전표에 다가갔다. 더 살펴 볼 것도 없었다. 짐승을 사냥 해서 잡아 먹다가 뼈가 이 사이에 낀 것이다. 반쪽으로 갈라진 뼈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입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이에 낀 뼈 때문에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 하였다. 미련한 짐승이지만 사람을 찾아 민가에 내려 왔다는 것은, 일루의 희망을 사람에게 걸어 본 것이었으리라.
우선 물을 떠 와서 입 안으로 흘려 넣어 주었다. 마시는 량이 한 잔이라면 흘리는 량은 한 바가지였지만, 그렇게 물을 마신 것만으로도 조금 생기가 돌아 오는 것 같았다. 안심을 시키느라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으르렁거렸다. 그 것 도 몇 번을 반 복 하자,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으르렁거리지를 않게 되었고, 그 때 함녕이 토끼를 잡아들고 왔다.
이 사이에 뼈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함녕이 이리저리 조심스럽게 살펴 보더니, 일격에 내려쳐서 순식간에 빼 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참지 못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토끼의 피를 입안에 흘려 넣어 주도록 해요. 그런 다음, 손으로 이 사이에 낀 뼈를 일격에 내려쳐서 빼 주고 먹이를 주면 될 것이에요"
"하하, 내게 맡기시오"
소매 안에서 여명부가 불쑥 튀어 나와, 살아 있는 토끼의 엉덩이를 찔렀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금전표의 입 안으로 흘려 넣었다. 피 냄새를 맡은 금전표가 눈을 번쩍 뜨더니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워낙 오래 굶어 힘이 빠졌는지 일어나지는 못하였으나 고개만은 쳐들고 핏방울을 흘리지 않고 목으로 받아 넘기는데 열중을 하였다.
떨어져 내리던 핏방울이 말라 가는 순간, 번개처럼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뼈를 내리쳤다. 고통을 느낄 틈도 없는 번개 같은 솜씨였다. 그리고 토끼의 배를 여명부로 가른 다음 내장을 끄집어 내서 금전표의 입안에 쑤셔 넣었다. 씹지도 않고 내장이 그냥 목구멍을 넘어 갔다.
"하하하...이제 기운만 차리면 된다. 멧 되지 한 마리만 먹고 나면 다시 살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