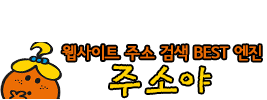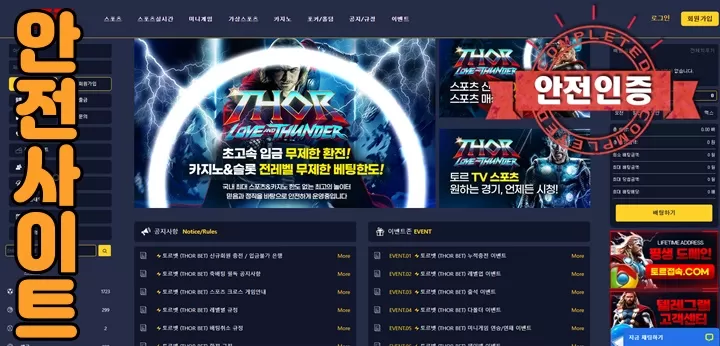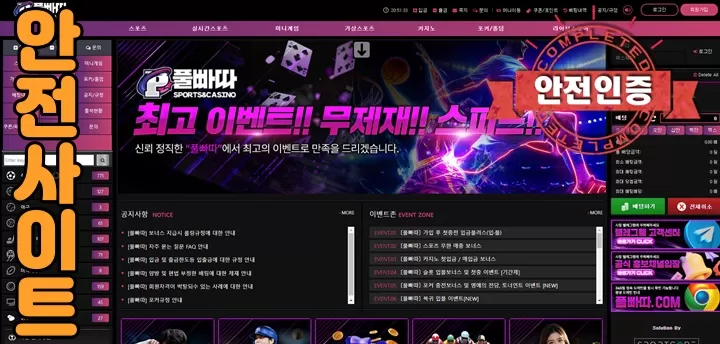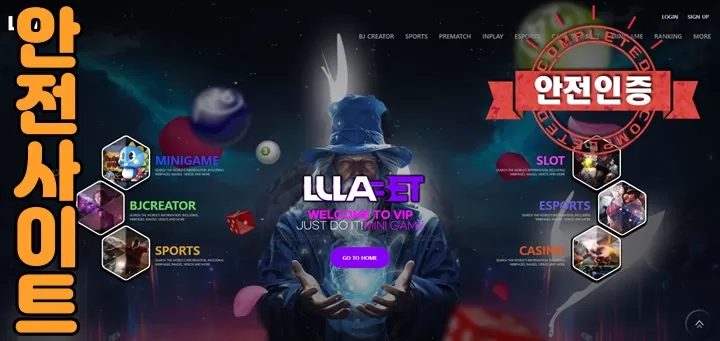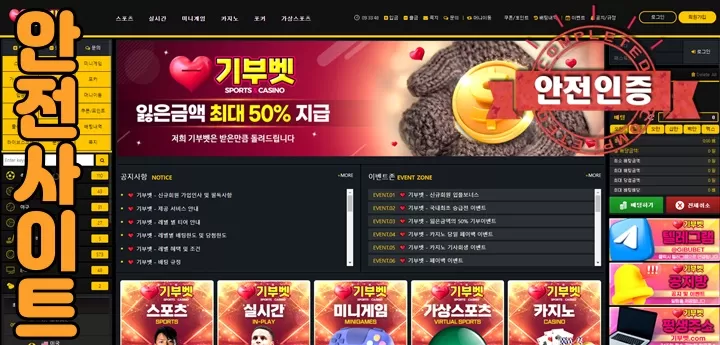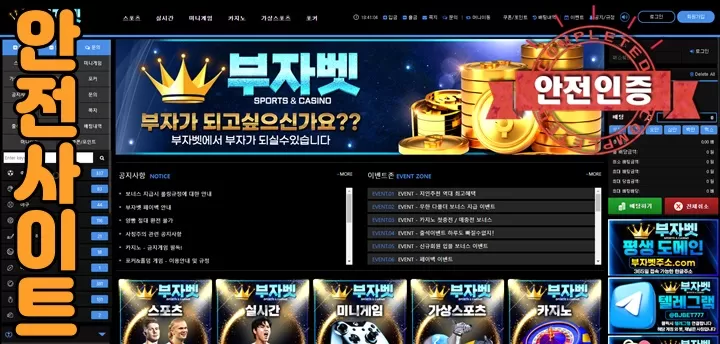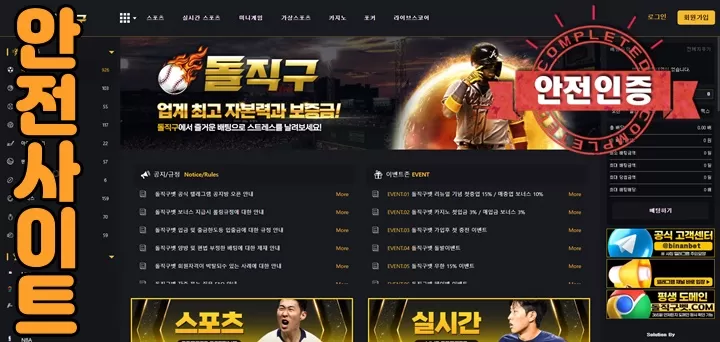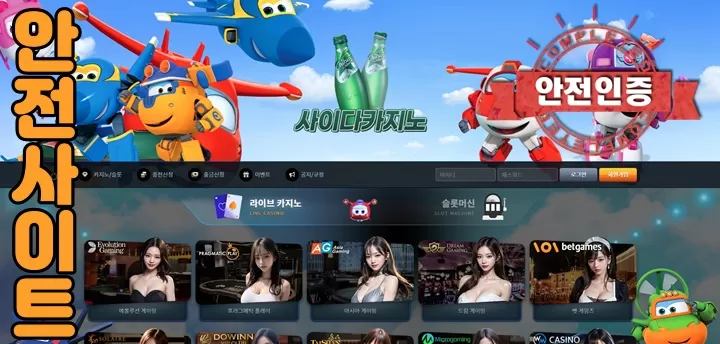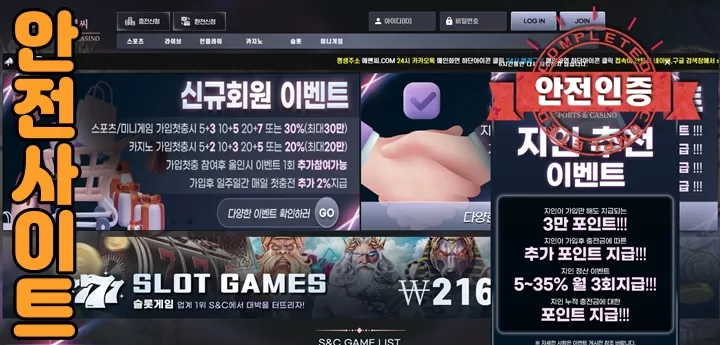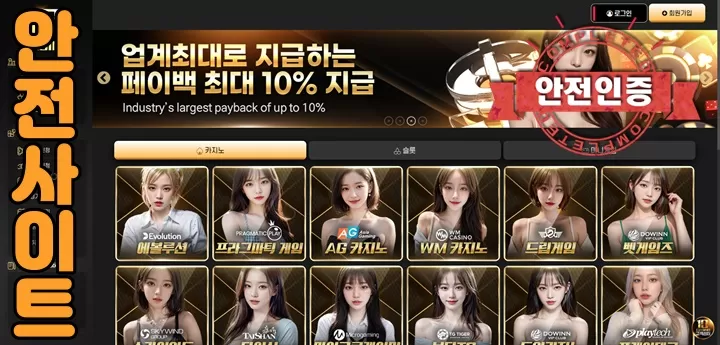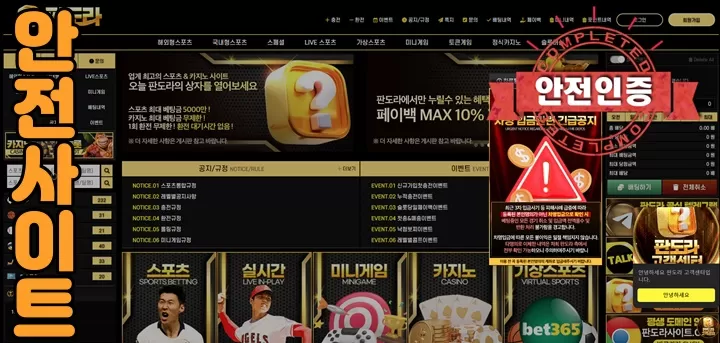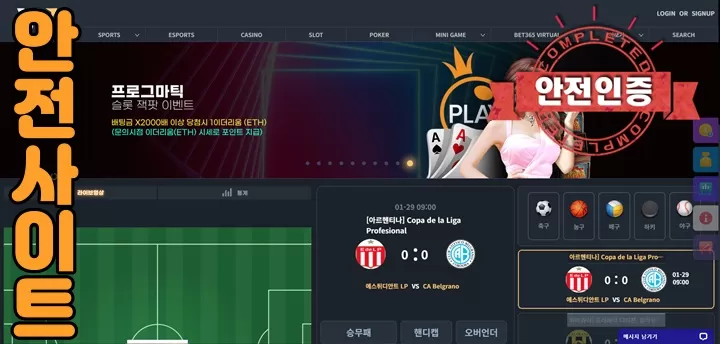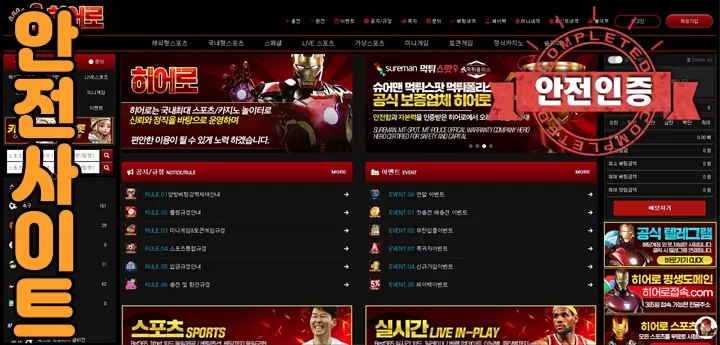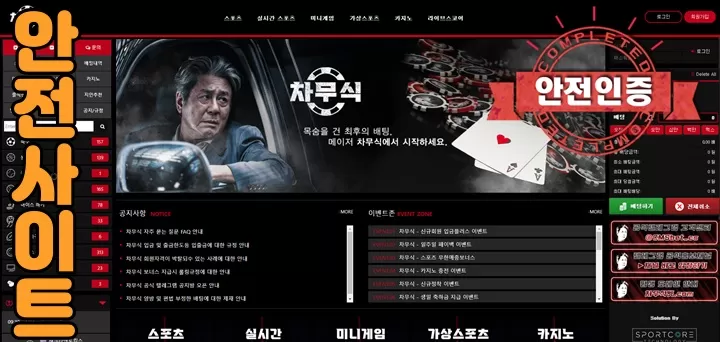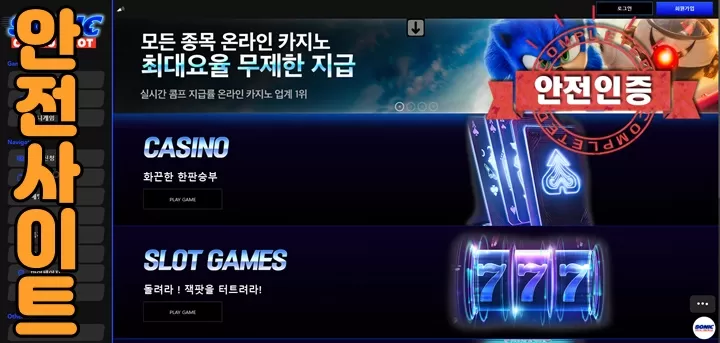이씨 집안의 둘째 며느리 상편
이씨 집안의 둘째 며느리 상편
그녀는 우리 읍내에서 큰부자로 알아주는 이씨 집안의 둘째 며느리였다.
대학도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선 지 교양 있고 지성적인 인상이 강해 보였다.
그녀는 나만의 비밀장소로 삼고 있는 이 곳에 갑작스레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들어왔다. 아마 버려진 빈집으로 알았던 모양이었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현재 소유권이 어쩐지는 몰라도 여긴 내 것이었다.
최소한 이 헛간은 그랬다.
물에 흠뻑 젖어 그녀의 늘씬한 몸에 찰싹 달라붙은 여름용 원피스는 재질이 뭔지 훤하게 안이 내비쳤다.
거의 벗은 거나 다름없었다.
나에게 밀쳐져 좀 전까지 내가 낮잠을 자던 담요 위로 엉거주춤하게 나자빠진 터라 희멀건 허벅지가 전부 드러난 데다 순백의 작은 면 팬티마저 슬쩍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치마를 여며 하체를 감출 생각도 못하는지 겁먹은 어린 사슴 마냥 큰 눈을 동그랗게 치뜨고 오들오들 떨었다.
난 그리 착한 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나가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를 한차례 떠민 것도 그저 곤히 자는 나를 방해했기 때문이지 딴 맘을 품고 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얼른 일어나 헛간 밖으로 달려나갔다면 난 내버려두었을 것이다.
실은 난 비가 온다는 것도 몰랐고 알았어도 개의치 않았을 터였다.
가뭄에 마른 논밭에 비가 내린다는 건 농사에 전혀 흥미 없는 내게도 바람직한 일로 여겨졌으니까. 저 빗속에는 기쁘게 일하러 나온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서고 그녀는 앉은 채 얼마간 서로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날 모르지만 난 그녀를 안다는 단순한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또 어차피 가까운 시일에 이 고장을 뜰 참이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는 곧 나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나는 여전히 비에 젖은 매끈한 다리를 내보이고 있는 그녀의 발 앞에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여 내 시선을 피했다.
그 때였다. 난 그녀가 별로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그녀는 벙어리라도 된 듯이 그녀가 신고 있던 샌들과 흰 양말을 내가 벗겨내는 동안에도 잠자코 있었다.
하긴 나도 좀 이상하긴 했다. 왜 그것들부터 치우려했을까.
맨 발이면 도망을 못 할거란 생각을 해서였나.
" 발이 참 예뻐요. "
난 진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멍청한 소리를 했다.
그녀는 상체보다 훨씬 긴 하체를 지닌 여자였다. 물론 길뿐 아니라 아름다웠다. 미세하게 꼬물대는 발가락부터 허벅지가 맞물리는 곳까지 더없이 근사한 다리였다.
멍청한 소릴 지껄인 뒤 나는 그녀의 오른발을 들어 입가로 가져왔다.
순간 그녀는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두 손을 등뒤로 뻗었다.
나는 엄지발가락을 입에 넣고 살짝 깨물었다.
이어 강하게 깨물어보고 다른 발가락들에도 그같이 했다.
그녀는 이제 겁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예상외의 상황 전개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약간은 즐기는 기색도 엿보였다.
나는 왼발을 마저 들어 깨물고 핥아댔다.
머릿속으론 그녀가 날 변태로 여길 거라고 걱정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전에 가졌던 여자들과의 정사에서 난 결코 이렇지 않았다.
그냥 좀 여자를 만지작거리다가 올라타고 기분 좋게 내려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놈이었다.
지금처럼 여자의 발 따위에 관심을 보이는 짓거리는 해본 기억이 없다.
조금도 더럽다거나 하는 느낌도 없이 나는 꽤나 오랫동안 그녀의 양발을 가지고 놀았다.
그녀는 두 발이 허공에 뜬 상태라 자연히 담요 위로 누운 자세가 됐다.
간지러운지 낮게 킬킬거리기도 하고 무언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혀를 내밀기도 하는 그녀와 간만에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내가 보는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치마로 가져갔다.
훌렁 젖혀진 치마를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희멀건 허벅지 위로 더 높이 들춰 올리더니 앙증맞은 크기의 팬티를 공개했다.
물에 푹 젖은 팬티는 그 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비쳤다.
도톰하게 자리한 둔덕은 물론이요 적당히 돋아난 방초의 숲을 전부 보이고 있었다.
둔덕 중앙에 세로로 오목하니 패인 모양까지 확인한 나는 왼손을 뻗어 갔다.
나의 의도를 눈치 챈 그녀는 망설이면서도 자신의 팬티를 한 옆으로 치웠다.
보드랍기 그지없는 붉은 살점은 이전에 본 어느 여성의 것보다 고왔다.
감히 손대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 하아아악. 아흐흥. "
파르르 전신을 떨면서 그녀는 은밀한 신음을 터뜨렸다.
한쪽 발을 놓아주자마자 그녀는 풀려난 다리를 멀찌감치 보내 버렸다.
곧게 빠진 다리를 사내가 감탄하도록 움직일 줄 아는 여자였다.
보통 그렇게 하는 모습은 약간 추해 보였는데 그녀는 안 그랬다.
팬티를 잡아 옆으로 당기고 있던 그녀가 둔부를 살짝 들어 벗으려 했다.
" 부우으윽 "
그녀는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만 팬티를 찢어발긴 나를 보고 생글거리며 웃었다. 나는 허겁지겁 옷들을 벗어 던졌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