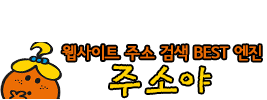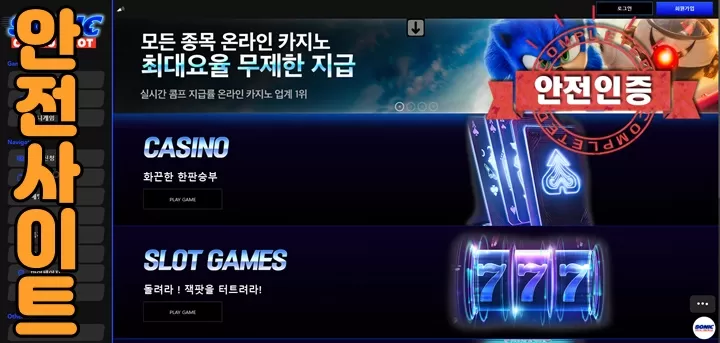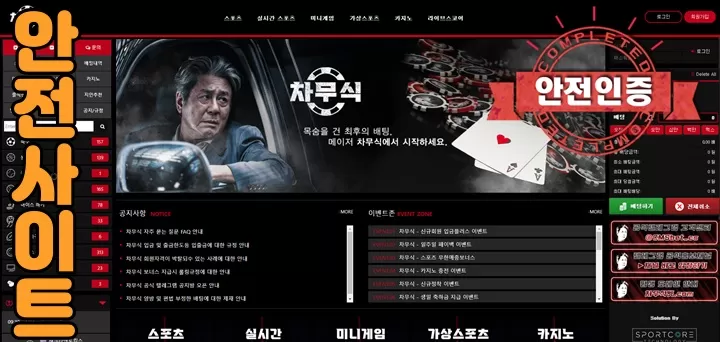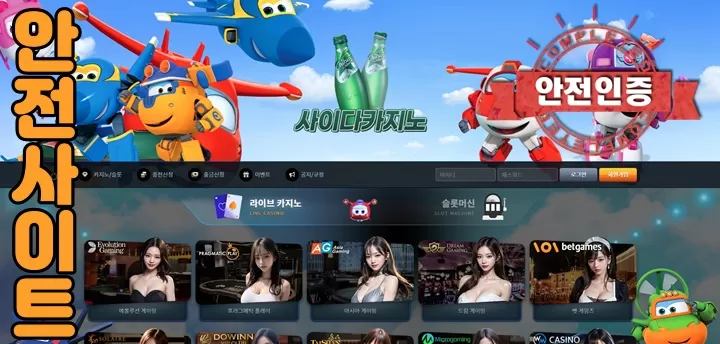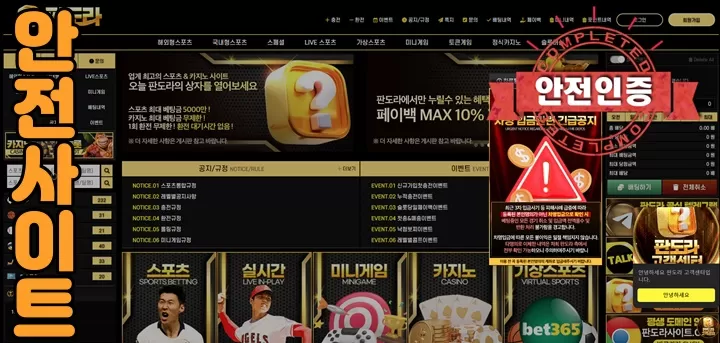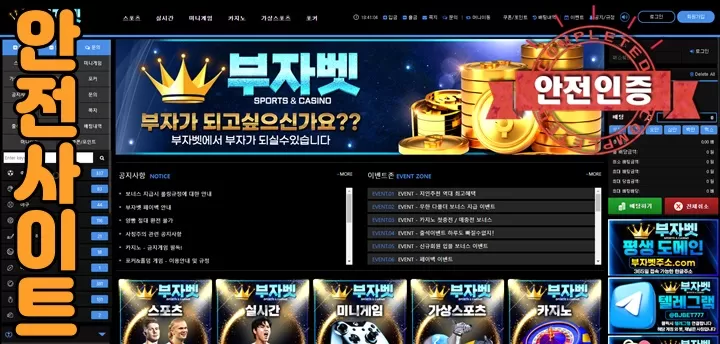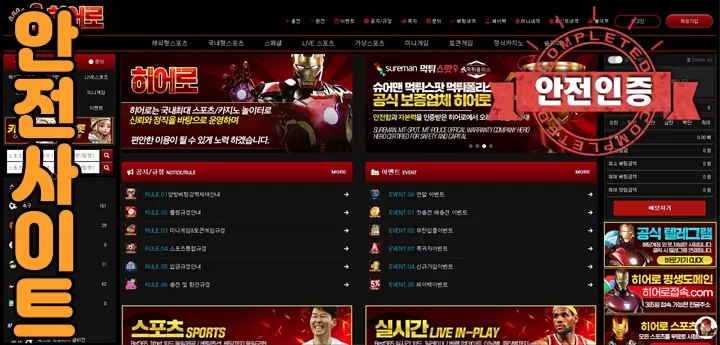이령(몸 서리)-6(완결)
이령(몸 서리)-6(완결)
6. 토끼들
“토끼가 또 새끼를 쳤구나.”
이쯤 되면 할 말이 사라진다.
“대체 뭘 먹기에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지?”
토끼에게 먹인 것은 건초 외에는 없다.
봄여름 잘 말린 건초를 먹였을 뿐인데 토끼는 계속 새끼를 쳤다.
처음에는 고작 몇 마리에 불과했는데 이제 토끼는 수십 마리로 늘어났다.
한 번 새끼를 낳을 때마다 늘어나니 이제는 굴이 부족했다.
“굴을 또 파야 할까요?”
지금 황궁의 후원에는 토끼 굴이 가득하다.
토끼는 우리가 아니라 굴에서 살아야 한다며 하나둘씩 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토끼의 개체 수가 너무 늘어서 이제는 후원 전체가 토끼 굴로 변했음에도 그것도 이제는 모자라게 되었다.
황후궁의 궁녀들과 내관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다.
그건 토끼에게 먹일 풀을 뜯어 말리는 것이다.
이령이 토끼는 생풀보다는 건초를 줘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황후궁에는 항상 건초 말리는 냄새가 진동했다.
“토끼는 이렇게 새끼를 잘 치는데 우리 마마께서는 왜 아직 소식이 없으신지.”
은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아는 이령을 따라 황궁으로 들어와 황후궁의 상궁이 되었다.
그리고 자인도 황궁으로 들어와 이령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금위장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곁에 두게 한 것은 황제의 배려였다.
“.”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지 그 이유는 오직 이령과 황제만 알고 있다.
아직 모두에게는 비밀이다.
“나는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황제는 이령에게 그렇게 물었고, 이령의 대답 역시 ‘아직은 아니다’였다.
황제는 혈기왕성한 나이의 사내고, 이령 역시 아직은 피가 끓었다.
덕분에 매일 밤 해가 지기만 하면 무섭게 침전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해서 아침까지는 떨어지지 않지만, 아이는 아직이다.
황제가 그녀의 몸 안에 파정을 하지 않는 탓이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녀의 몸 안에 파정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일찍 들어선다는 어의의 말에 황제는 방법을 바꾸었다.
사정할 기미가 느껴지면 이령의 몸 밖에다 파정하는 것으로 말이다.
아직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부족하기만 하다.
여기에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것이 황제의 불안이다.
황제가 이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황궁 안에서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황제는 태자 시절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다 살아났고, 이령 역시 원인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오래 병석에 누워 있었던 탓에 도성에는 한때 이령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렇게 죽다 살아나서 태자는 황제가 되었고 이령은 황후가 되었다.
그런 탓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애정이 지극해서 누가 봐도 한 쌍의 원앙이었다.
선황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급사했고, 그 죽음은 극소수만 아는 비밀에 부쳐졌다.
“황제 폐하 드십니다.”
밖에서 황제궁의 상궁이 고하는 소리에 은아가 퍼뜩 일어났다.
토끼를 품에 안은 이령이 돌아섰을 때 황제가 후원으로 들어섰다.
“폐하, 또 새끼를 치려나 봅니다. 배가 불렀어요. 보세요.”
이령이 황제에게 토끼를 내밀었다.
그녀에게서 토끼를 받아 든 황제가 다정하게 웃었다.
“잘 먹여서 그런가 보오.”
“또 굴을 파야겠어요.”
“토끼를 방사하는 것은 어떻겠소?”
“방사요?”
“넓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건데.”
“그러면 나라 전역이 토끼 굴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가?”
두 사람이 나란히 후원을 걷기 시작했다.
황제는 오후 즈음이 되면 항상 후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령과 산책을 한다.
뒤따르던 궁녀들과 내관들이 눈치껏 알아서 뒤처지면, 그때부터 황제는 이령을 업고 걷는다.
이령은 작고 가벼워서 황제는 그녀를 거뜬하게 업고 후원의 연못 주변을 몇 바퀴나 돌고는 했다.
황제의 등에 업힌 이령이 여전히 그의 머리를 묶고 있는 붉은 댕기를 쳐다봤다.
황제의 관 아래에 붉은 댕기가 언뜻 엿보였다.
황제는 이 댕기를 풀어 놓고 다니지 않는다.
그녀가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아니, 예물이기 때문이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다.
저 토끼들도 그리고 이 댕기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예물이다.
황제의 이름은 락원이다.
그러나 이령만 아는 황제의 이름이 있다.
도치.
사내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다.
워낙에 깊게 생겼던 상처라서 아물고 난 다음에도 흉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명주실로 꿰맨 흔적도 여전하다.
이령과 이 사내 그리고 사독만 아는 비밀이 있다.
이 사내가 누군지, 그것은 오직 이들만이 아는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황제의 쌍둥이 형은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인 채로 죽어 땅에 묻혔고, 쌍둥이의 반쪽만 살아남았다.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다.
그 살아남은 반쪽이 이 황제다.
진짜 진실은 이령과 사독과 이 사내만 안다.
이 사내는 쌍둥이 반쪽의 이름을 훔쳤다.
이미 죽은 자였지만, 그 죽은 자에게서 이름과 신분을 훔치고, 그리고 삶도 훔쳤다.
그의 정혼녀와 혼인해서 지아비가 되었다.
사내는 지금도 가끔 황궁의 가장 깊은 후원 대나무 숲에 만들어진 묘비 없는 흙무덤에 가서 술 한 잔을 올리고 온다.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이 역시 이령과 사독 그리고 이 사내밖에는 없다.
그 무덤 앞에 서서 사내는 늘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무엇이 그리 미안한지 사내는 그 말 외에는 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령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사내가 무덤의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이령은 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
사내는 미안했고, 그녀는 감사했다.
그리고 그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령과 사내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무겁지 않아요?”
이령이 저를 업은 사내에게 살며시 속삭였다.
“조금 더 먹어야 무거워지겠소. 아직은 아니야.”
“그 집에 가 보고 싶어요.”
“모두가 잠들면 담을 넘어가 볼까?”
사내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 작은 초가는 아직도 그곳에 있다.
가끔 생각이 날 때면 이령과 사내는 그곳에 간다. 그리고 낡은 지붕의 이엉을 새로 엮고, 장작을 채우고, 마당을 쓴다.
허물어진 울타리를 수리할 때도 있다.
그 일을 할 때면 자인도 돕는다.
그곳에 가서 살 일은 없겠지만, 이령에게 있어서 그곳은 다정한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다.
마치 어머니의 유품 같은 그런 곳이다.
떠올리면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행복이 묻어 있는 곳.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곳은 이 사내가 있는 곳이다.
어디라도 상관없다.
이 사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황궁이든, 초가집이든 상관없다.
이령의 마음은 이미 사내에게 있고, 사내의 마음은 이령에게 있다.
자신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안다.
“수염이 또 자랐어요.”
이령이 사내의 턱에 난 수염을 보며 작게 웃었다.
사내의 수염을 자르는 것은 이령의 몫이다.
사내의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랄 때면 이령이 항상 작은 칼을 들고 사내의 수염을 깎아 준다.
그러면 사내는 얌전하게 앉아 이령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사내는 황제였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저 순한 사내였고, 이령은 황후였지만 사내 앞에서는 수줍은 여인이었다.
황궁에서 두 사람을 황제와 황후라고 부르지만, 두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는 그저 지아비고 아내일 뿐이다.
그것보다 소중한 호칭은 없다. 사내는 지아비고, 여인은 아내다.
여전히 손을 잡고 있고, 여전히 등에 업힌다. 그리고 함께 걷는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여전히 사랑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