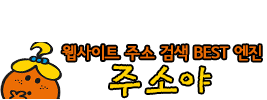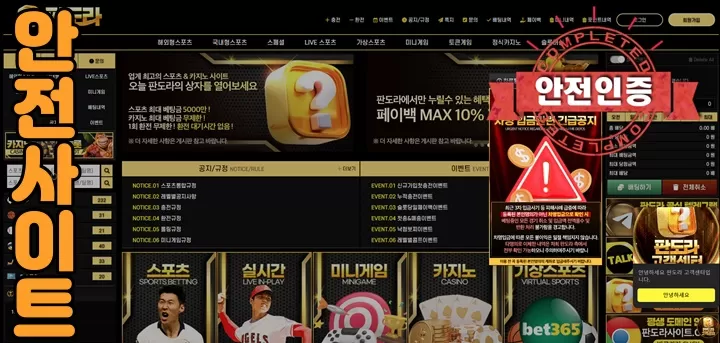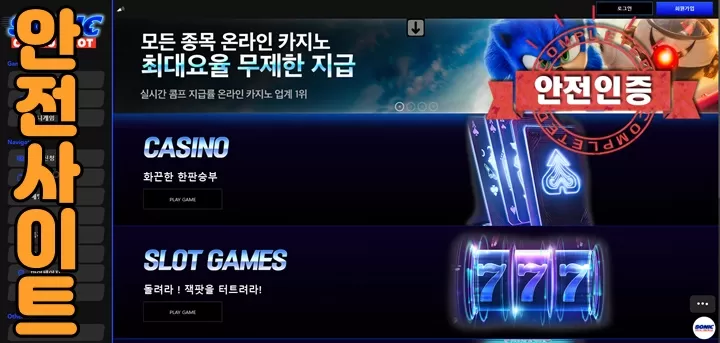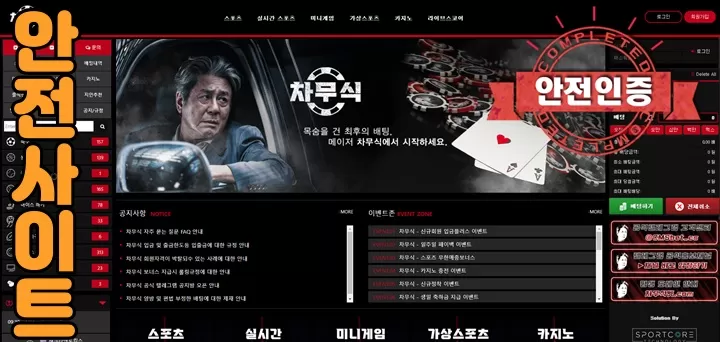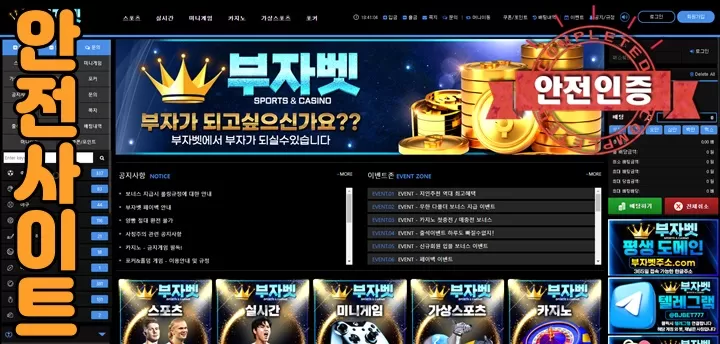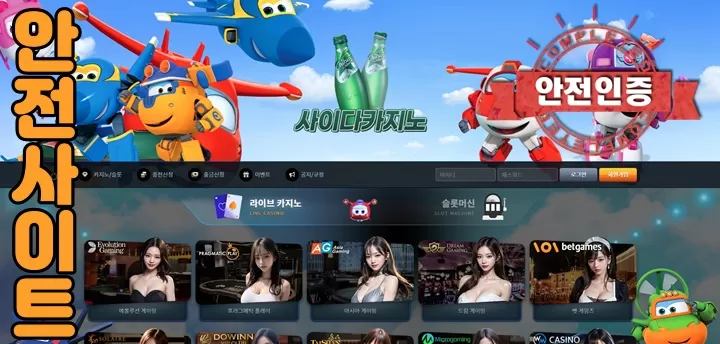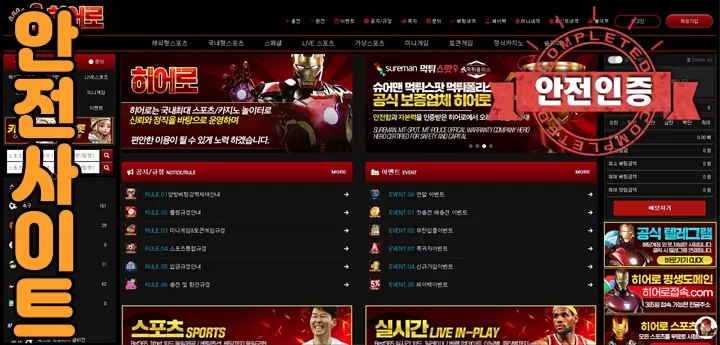나의 외도..3
나의 외도..3
어둠을 걷어내려 미등을 켰다.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흔들리는 표정으로 내게 묻는다.
"나 한심해 보여요?"
"왜?"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렇게 따지자면 나도 똑같은 입장이니..."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요. 당신 몸이 따듯하고 포근해...
"
"오랜만이에요...남편과 사이가 나빠진 뒤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관계가 나빠졌나 보군."
"응..."
"남편이 미워 복수심에 이러는 건가?"
"..."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니, 나 많이 외로웠었어요. 너무나..."
"그래요, 어쭙잖은 말인 건 알지만 내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
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손을 잡았다.
땀에 젖어 얼굴에 붙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입술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아직 미처 식지 않은 그녀의 열기가 내 입술에 느껴진다.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혀로 자극을 주니 살며시 그녀의 혀가 마중을 나온다.
도드라진 그녀의 유두를 살며시 손가락으로 비비듯 만지자 그녀가 또다시 뜨거운 숨결을 내뱉는다.
"아... 거기요... 거기..."
"가슴을 만지면 좋은가요?"
"응."
"또 하긴 힘들 텐데..."
기운 빠진 내 남자를 의식하며 그리 말을 하니 그녀가 괜찮다고...그냥 만져달라고 말한다.
약한 미등 불빛에 보이는 그녀의 얼굴. 약간 찡그린 듯한 그녀의 얼굴이 고혹적이다.
내 입술은 그녀의 두 속눈썹을 부드럽게 스치고 다시 코끝을 지나 입을 거쳐 귀를 향한다.
꿈틀대는 그녀의 몸, 뜨겁게 내뱉는 그녀의 숨결....
나 또한 뜨거운 숨결을 그녀의 귓속 깊은 곳에 불어넣는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듯 고개를 옆으로 틀며 달뜬 신음을 흘린다.
가슴에 얹혀있는 내 손등 위로 그녀의 손이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리곤 곧이어 내 손을 밑으로 밀어낸다.
시트 밑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끈적이는 몸이 다시금 불붙듯 뜨겁게 타오른다.
곱슬곱슬한 그녀의 둔덕 아래 습기 가득한 그곳을 그녀가 스스로 인도한다.
여전히 물기를 듬뿍 머금은 그녀의 호수에 도착하니 그녀의 중지가 내 손 중지를 힘주어 누른다.
난 그녀의 유두를 이로 살살 깨물듯 애무하며 중지를 조심스레 호수 깊은 곳으로 집어넣었다.
"흐...윽"
단말마의 신음과 함께 그녀의 가슴이 크게 솟아오른다.
"아...좋아요...깊게, 좀더 깊게...나 욕하지 마요. 나쁜 여자라 욕하지 마요..."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도덕적 관념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아니, 욕하지 않아. 절대로..."
그녀의 손이 내 배의 굴곡을 따라 밑으로 향한다.
축축이 땀이 배어있는 그녀의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는 내 남자를 힘을 주어 잡아간다.
"윽..."
그녀의 손이 내 남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 새로운 자극이 찾아든다.
내 손은 이미 그녀의 물기로 인해 끈끈함이 더해가고 난 커다란 갈증을 참지 못해 그녀의 깊은 호수에 입을 가져갔다.
마셔도 마셔도 마르지 않을 그 샘을 난 파고 또 팠다.
퍼덕이듯 튕겨 오르는 그녀의 허리를 두 손으로 내리누르며 그녀를 마신다.
다디단 그녀의 샘물은 끝없이 넘쳐나며 한껏 힘이 들어간 그녀의 허벅지가 내 등을 휘감는다.
"와요...나...아...와요..."
끊어지듯 이어져 나오는 그녀의 신음이 나를 더욱 채찍질한다.
-----------------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쌀쌀한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던 초겨울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신, 무슨 고민 있어?"
"아뇨."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인데...?"
"우리 다른 이야기 해요."
"그럽시다..."
어두운 그녀의 얼굴이 왠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바람이 제법 찬 인적 끊긴 백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찬 날씨에 얼어버린 그녀의 손이 내 손안에서 차츰 따듯한 기운을 되찾아간다.
말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는 발밑에 부드럽게 깔린 모래를 쳐다보며 걷고 있다.
"바람이 차요"
"응, 좀 쌀쌀하네."
"우리 들어가요"
내 눈을 그녀가 들여다보며 주머니 속에 얽혀있는 손을 힘주어 잡았다.
유난히 뜨거운 그녀의 몸과 미친 듯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혀는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듯했다.
한차례의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쓸쓸한 눈망울을 한 채 나를 본다.
그 눈 속에 내 얼굴을 담아두려는 듯...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뭔지 말해봐요."
"아니 할 말 없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녀의 말끝이 흐려짐을 느끼며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에 차오름을 느꼈다.
"그랬던 거였구나"
"..."
독백처럼 내뱉는 나의 말과 침묵과 함께 눈으로 말하는 그녀...
어지러이 흐트러진 침대 시트마냥 흐트러져버리는 마음을 추스르려 난 담배를 한 개비 입에 물었다.
"담배 줄여요. 몸에 해로워."
"응, 끊어야지..."
"담배도 줄이고, 몸 생각 하면서 일해요. 힘들 때란 건 알지만 건강해야 해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끈 후 난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살며시 당겼다.
얽히는 혀의 유희가 다시 시작되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다시 내 귓가에 내려앉는다.
그녀의 입술과 유방 그리고 흠뻑 젖은 깊은 호수까지 난 내 기억에 담으려 열심히 탐닉했다.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며 깊고 긴 신음과 함께 절정을 향한다.
두 번 다시 줄 수 없는 그 열정적인 몸짓을 그녀에게 선사하리라 생각하며 내 손과 입술은 끊임없는 여체의 굴곡을 따라 여행한다.
오늘이 가고 나면 이제 그녀의 습기 차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호수는 없으리라.
귓가에 쏟아내던 이 달콤하고 따듯한 숨결이 이 시간이 가고 나면 이젠 기억으로만 남으리라.
해가 떨어지고 바람이 더욱 차가워진 저녁거리에 우리는 마주 선체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다.
말없이 두 손에 꼭 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듯한 온기를 전하며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이 느낌을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듯이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
택시에 그녀를 태워 보내고 차에 오른 난 그녀의 뒷모습만 되풀이해 떠올린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일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평온하게 흐르며 구름 사이에 잠깐 얼굴을 드러낸 해가 다시 막 구름 속에 모습을 감출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작별을 고했다.
다시 노력해보겠노라고.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정성스레 안아줘서 고마웠노라고.
내 건강을 걱정해주며 또, 내 기분 상함을 걱정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