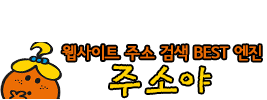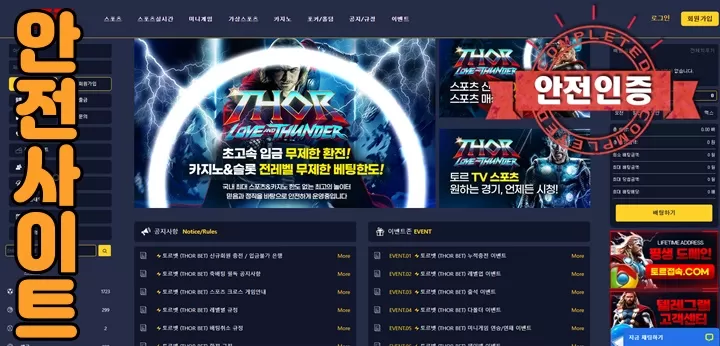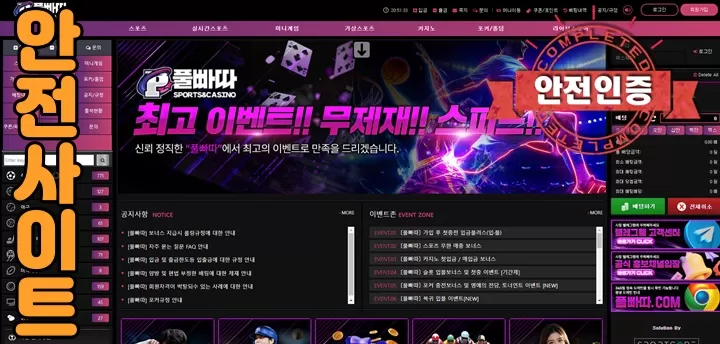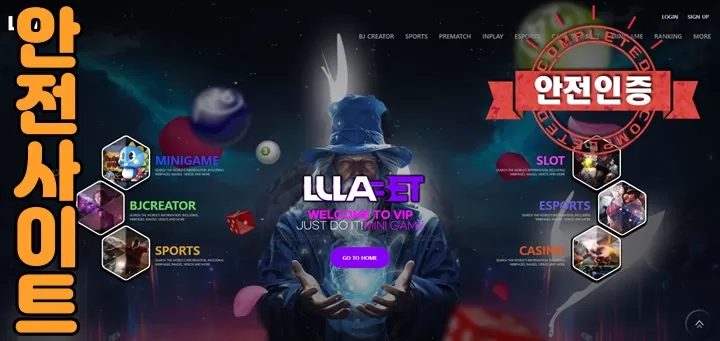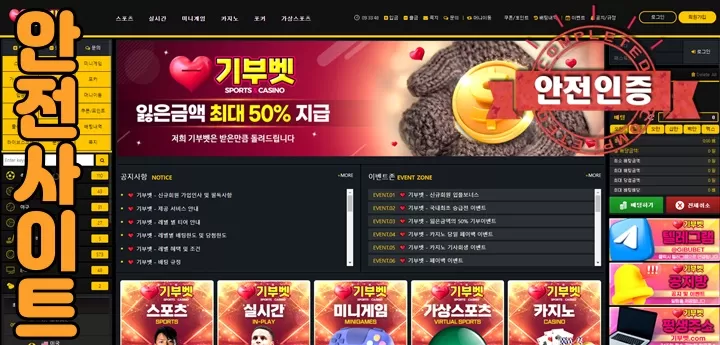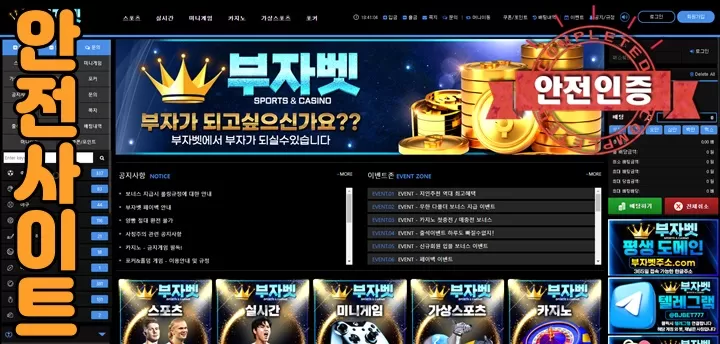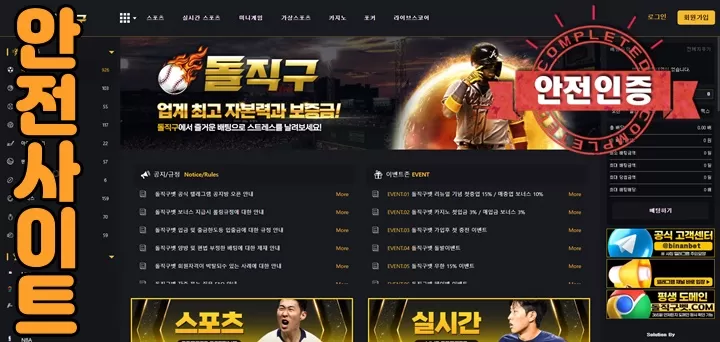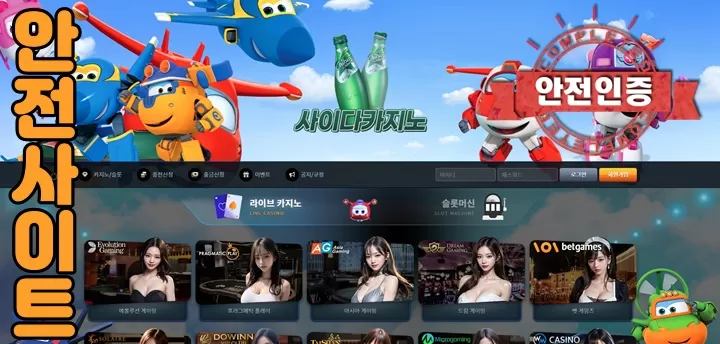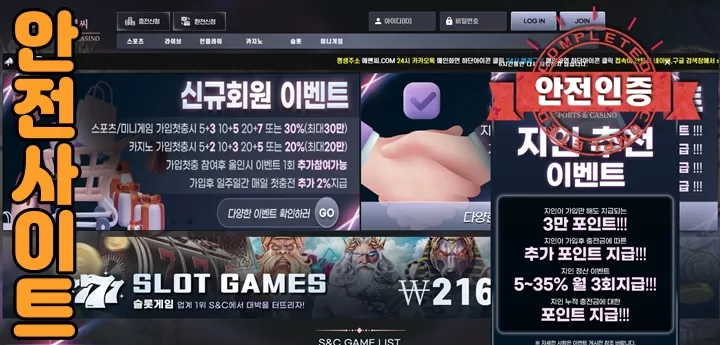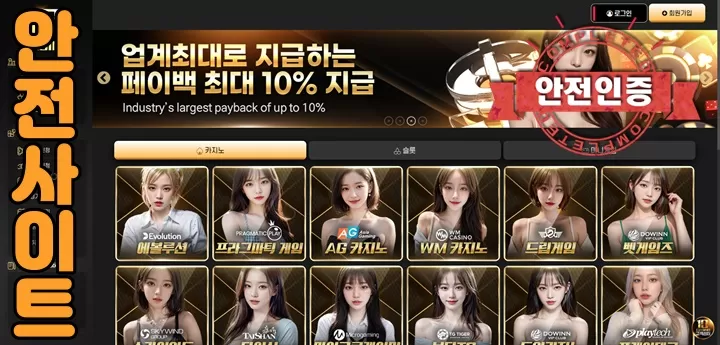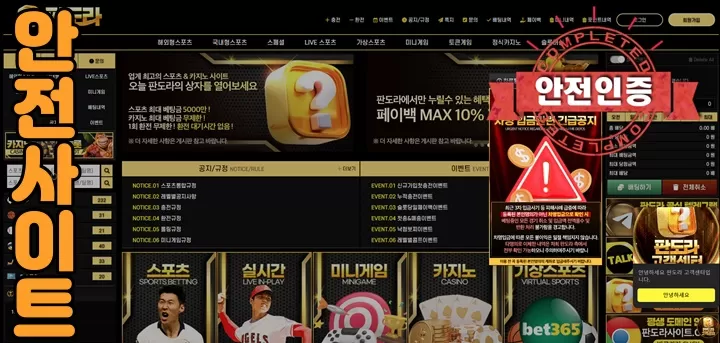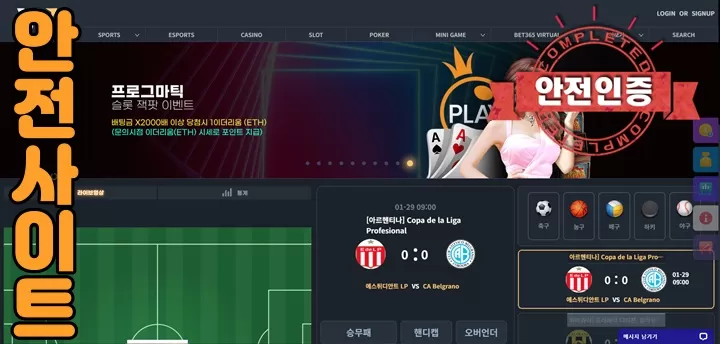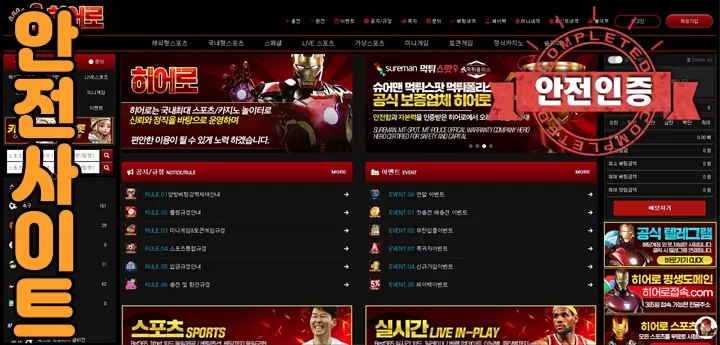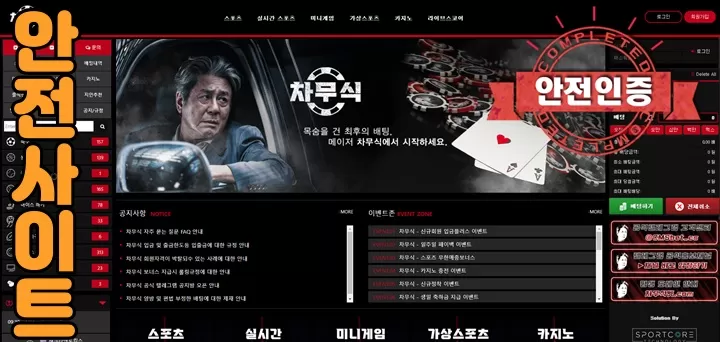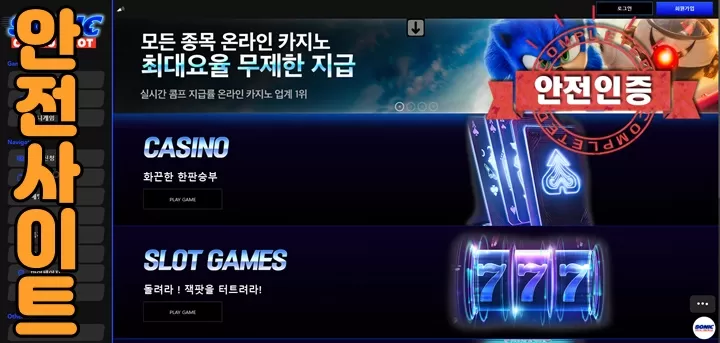1970년 서울 - 3부
1970년 서울 - 3부
따듯한 난방이 들어오는 아주 포근한 방...
나는 다리를 벌리고 대감님의 굵은 말뚝을 내 아랫도리에 심는다. 아주 깊숙히...
대감님의 강한 허리가 그 뿌리를 심었다 뽑았다를 반복하면 산에서 산새소리가 들리듯 내 목청에선
신음소리가 울려퍼진다.
"아... 아..."
나도 모르게 대감님의 등을 꼭쥐고 벌리고 있던 두 다리를 대감님의 허리에 감싼다. 아주 강하게...
"더... 더.. 더 빨리 해주세요... 아..."
내 신음 소리에 힘입어 대감님의 허리를 괴물처럼 움직인다. 내 꽃잎동굴은 홍수에 범람한 물들로
가득찬다.
대감님의 허리에 힘이들어가고 숨이 빨라지며 나의 양 가슴을 한없이 꽉 쥐신다. 아주 꽉...
"싸면 안돼... 요...!"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젯밤 부엌에서 잠이든 모양이다.
"꿈이였군..."
다행이였다는 생각보단 아쉽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하였다.
신랑이 전쟁통에 저리되고 좁은 집에서 생활하다보니 성행위를 못하고 산지도 벌써 몇해년이 되어간다.
굶주려 있었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 조차도..
"이보게. 이보게."
부엌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새벽녘에 비추는 모습의 실루엣이 누군지 잘 알수가 없었다. 자세히 보니..
"아.. 아주머니.."
어제 나에게 양식과 장작을 주신 아주머니셨다.
"오늘 먹을 밥은 있어? 이거 먹고, 이제 앞으로는 주기 힘들꺼야. 불은 아직 살아 있나보네."
"아주머니..."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시는 아주머니의 정성에 그저 눈물이 터질 듯 했다.
방쪽에서 신랑아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나보다. 시끄러웠다.
식구들에게 밥을 챙겨먹이고 나는 내일 해먹을 양식을 만들기 위해 주인집 텃밭에서 일을 해야 했다.
"놀지말고 일해! 대감님 눈밖에 나면 굶어 죽는다고."
머슴한명이 큰소리로 우리를 다그쳤다. 대감님이란 호칭을 들으니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일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본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대감님집 머슴으로 있는 당쇠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날 왜 쳐다보지?"
내 옷주변을 살펴보니 가슴쪽이 많이 해어져서 속가슴이 살짝 비추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등을 지고 앉아서 호미질을 했다. 하지만 뒷편의 시선이 자꾸
신경에 쓰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을 하다보니 사람들의 무리와 약간 뒤쳐지게 되었다. 뒷편에서 혼자 꽁꽁언 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엉덩이쪽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당쇠가 손으로 내 왼쪽 궁둥이를 만질려 하고 있었다.
"꺄!"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쇠와 눈이 마주쳤다.
"아.. 아니, 이년이 죽을려고 그러나! 뱀이 그쪽으로 지나가길래 잡아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쇠는 나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쳤다.
부끄러웠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집고 있던 호미를 집어던지고 눈물을 손으로 가리며 뒷산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뒷산중턱에는 내가 참 좋아하는 곳이 있다. 흰바다를 본적이 있는가?
가을쯤에 오면 흰갈대가 바다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 모습을 구경할 수 없다.
하지만 그곳은 나에게 슬픔을 감추기 위한 적당한 비밀장소였다.
"흑흑... 흑..."
눈물을 흘리고 자탄하고 있을때 누군가 나의 머리를 잡고 뒤로 잡아 당겼다.
"아야!"
너무 쌔게 잡아당겨 굉장히 아팠다.
내 몸위로 무엇인가가 올라왔다. 아주 빠르게 나의 옷을 풀어 해치고는 나의 가슴을 핥는다는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봤더니 당쇠가 나를 뒤 쫒아 온것이다.
"왜 이래! 이러지마..!"
"가만히 있어봐! 나 좀 살려달라고! 한번만.. 딱 한번만..."
당쇠의 힘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정도 였다.
나의 한팔을 잡고 있는 그의 힘은 여자 100명이 와도 못당할 정도로 강했다.
"아.. 아파.. 이거 노라니까요!"
"으..."
당쇠가 나의 치마를 들추고는 어느센가 속바지의 허리끈을 풀어 해쳤다.
"사람 살려!"
하체는 알몸을 들어보이며 당쇠의 거친 소같은 혀로 나의 보지를 핥기 시작했다.
"하악.. 하악.. 끝내주는구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당쇠의 한쪽손이 나의 입을 막더니 더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완강하게 막기 시작했다.
코까지 같이 막아서 숨도 못쉴지경이였다.
"어떻게 할텨? 여기서 죽을텨 아니면 한번만 할껴?"
숨을 쉬고 싶었다. 오로지 숨을 쉬고 싶었다.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다.
숨을 쉬기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주 큰 쇠말뚝이 나의 보지에 박히는 기분을 느꼈다.
"!"
당쇠는 더이상 나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느끼는 생각과 기분으로 나의 몸 위에서 흔들고
있을 뿐...
신음소리 조차 나오지 않았다. 고통? 수치? 처절한 패배감 때문이였다.
"윽.. 윽... 나 나오는디.."
"..........."
당쇠의 동작이 빨라지고 숨이 막혀 죽을꺼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향해 목을 빼는 당쇠...
순간 아랫배가 따듯해진다. 사정을 한것이다.
당쇠는 옷을 불이나케 입고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헛기침만 두어번 하고 산을 내려간다.
나는 흰 엉덩이를 드러낸체 바닥에 주저앉아 천천히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 피눈물 같은 빨간 눈물이 내 두눈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흑... 으으.. 흑..."
서럽고 억울한 기분에 눈물을 꺼이 꺼이 흘리며 나는 괴로웠다.